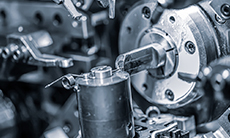유럽 축구 명장 조제 무리뉴와 위르겐 클롭은 정반대의 철학으로 팀을 이끈다. 무리뉴는 “지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 줄 수비에 집중하고, 클롭은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며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을 펼친다. 연금 투자도 마찬가지다. 은퇴 준비는 무리뉴처럼 지켜야 하고, 동시에 클롭처럼 기회를 잡아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을 잃는다.
연금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일이다. 모든 돈을 안전자산에 묶어두면 물가를 못 따라가고, 공격적으로만 가면 은퇴 직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해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오래 전부터 활용해온 전략이 바로 ‘핵심(Core)–위성(Satellite) 전략’이다.
핵심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다. 글로벌 주식·채권 인덱스펀드,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적은 단순하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확보하며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연금 계좌는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만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안정적 ‘코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와 금리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고, 특정 산업이나 자산군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여기서 위성 전략이 등장한다. 위성은 핵심을 보완하는 작은 자산들이다. 반도체·인공지능 ETF, 배당주 펀드, 원자재·대체투자 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성의 목적은 두 가지다. 추가 수익을 잡고, 코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는 글로벌 인덱스펀드에 두고, 30%를 위성으로 운용한다고 하자. 인덱스펀드가 시장 평균을 제공하는 동안, 위성은 산업 성장이나 물가 상승 국면에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미국 대형 연기금들은 보통 70~80%를 코어로 두고 나머지를 대체투자·테마 자산으로 채운다. 이는 단순한 ‘채권 vs 주식’ 구도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프레임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위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변동성이 높아진다. 또 위성 상품은 운용 보수가 높아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는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 위성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 보수적 투자자는 10% 이내, 공격적 투자자는 30%까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핵심–위성 관점에서 자산을 점검하고 연 1~2회 리밸런싱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운용하면 안정성과 초과 수익이라는 목표를 혼동하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와 상황 맞춤 자산 배분이 가능해지고,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도 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운용 과정을 엄격히 조정할 수 있다.결국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은 이 균형에서 나온다. 연금 계좌를 열어 투자 현황을 살펴보라.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위성이 떠 있는가, 아니면 코어만 남아 있는가? 그 균형이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mjeong@sedaily.com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