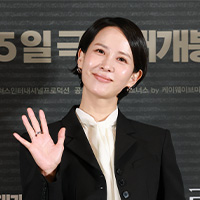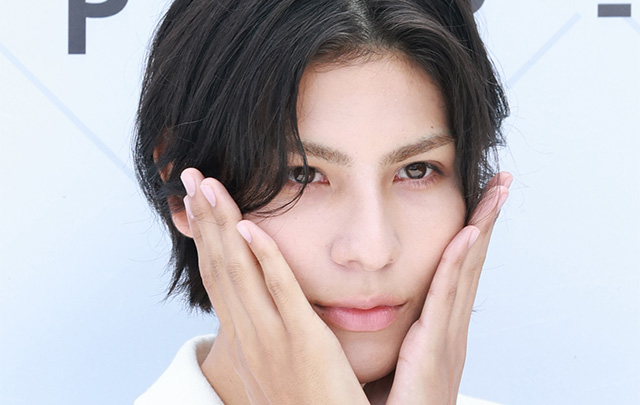법원 청사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많은 그림이 걸려 있다. 사람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법적 다툼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법원 특유의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를 쉽게 지울 수 없다. 그림은 그런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장치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내부에도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한다. 원고와 피고가 그림을 감상할 여유는 없겠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하라’는 사법부의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법원 풍경은 이 그림이 주는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배당되면서 재판부의 일정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3대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재판 기간’ 조항이 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검 사건이 하나씩 배당될 때마다 재판부의 부담은 커진다. 통상 재판이 없는 날에는 판사들이 기존 사건을 검토하거나 동료들과 논의하지만 그 시간조차 특검 사건에 할애되며 다른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볼 여력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형사 담당 판사들은 본래도 시간에 쫓긴다. 구속 피고인을 심리할 경우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기에 무리한 일정도 감수한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지만 형사보다는 낫다”는 말을 하는 판사들이 많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으로 사법부를 더욱 몰아붙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 아래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여유’다. 법원에 그림을 걸어둔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사법부가 여유를 가질 때 ‘속도’와 ‘정밀함’ 사이의 균형 잡힌 재판이 가능하다. 무언가에 쫓겨 성급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