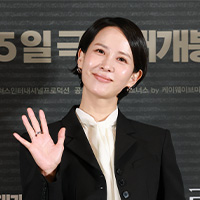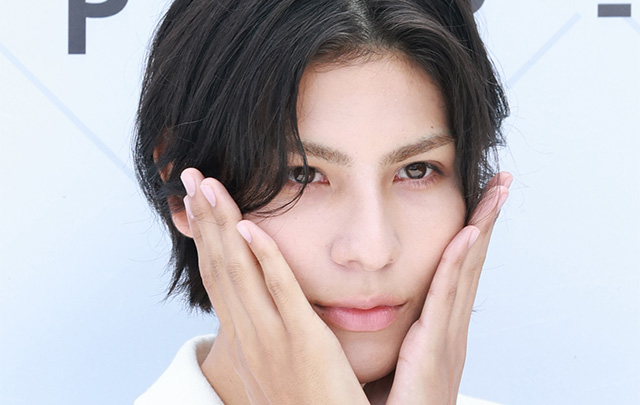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8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최저치를 72.5%로 올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기준에 맞춰 현 수준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약 11조 9600억 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한국 은행들은 이 규제에 따라 현행 60%인 내부등급법(은행 자체 방법론)상 RWA 최저치를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대출을 유지하면서 자본비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최소 12조 원가량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자·비이자(수수료) 이익 증가→당기순이익 확대→자본 확충’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예대마진은커녕 최소 조 단위의 추가 부담이 예정돼 있다. 당정이 예고한 △교육세 인상(1조 3000억 원) △보이스피싱 배상(피해액 1조 원) △배드뱅크 출자(4000억 원) △가산금리 산출 시 법정 비용 제외(3조 원) 등만 5조 7000억 원가량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은행에 단순히 상생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금융권을 동원하고 세수 증가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며 “은행이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낸다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 이어 또다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감독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 산업 발전 △소비자 보호의 3대 축이 중심이지만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의 산업적 역할은 작게 보면서 소비자 보호를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각종 기금 출연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을 돈 나오는 화수분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금융권 쥐어짜기’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전성 제고와 주주 환원에 필요한 재원은 외면한 채 은행에 대한 각종 지원 요구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자산(RWA) 최저하한선 규제가 최종 목표인 72.5%까지 올라갈 경우 5대 시중은행의 RWA는 약 7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있어야 현 수준의 기업대출과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가 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4대 금융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21조 원을 넘는다며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2%로 1년 전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1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연체 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한 달 새 4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실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야 건전성을 지키면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익이 많이 난다고 여기저기서 곶감 빼 먹듯 하면 결국 은행의 건전성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공적 자금 지원 등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권에 사회적 문제 해결까지 떠넘기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만 해도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1~6월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7766억 원이나 됐다는 점에서 연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보험업권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 중 1조 원을 초과한 구간에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기로 한 것 또한 부담이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재원으로 쓰인다. 금융사의 수익 원천과는 무관하다. 세법학계에서도 금융사의 교육세 납부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하지만 한 정부 인사는 “교육재정이 빠듯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타협할 여지가 작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 인상으로 금융회사에서 걷는 교육세가 전년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가산금리에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은행권에서는 이에 따라 약 3조 원의 비용이 대출금리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4000억 원을 출자해야 하는 것 역시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 같은 정책들로 금융 업계에 예상되는 추가 비용만 5조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생기금도 500억 원가량 된다. 여기에 10조 원 이상으로 점쳐지는 국민성장펀드 출연이나 추가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까지 고려하면 금융권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나친 상생 압박을 하면 생산적 금융에 쓸 여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