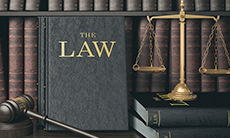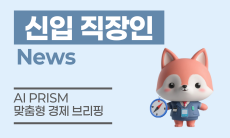사람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단순히 생활습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교육 수준이나 상실 경험 같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레너드 데이비스 노년학 스쿨 연구팀은 1988~1994년과 2015~2018년 사이 5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노화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미국인의 노화 속도는 늦춰졌지만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과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 사이의 생물학적 노화 차이는 과거 약 1년에 불과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2년에 달했다. 제1저자인 마테오 파리나 조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물학적 노화가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사회적 성과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흡연·비만·약물 사용 등 생활습관 요인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 책임자인 아이린 크리민스 교수는 "교육은 직업, 의료 접근성, 건강 습관 인식 등 생애 전반의 기회를 결정하며 이 과정이 신체의 노화 속도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도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두 명 이상을 상실한 성인의 경우 DNA 메틸화 기반 '에피제네틱 시계(epigenetic clock)' 지표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눈에 띄게 높게 측정됐다.
연구 책임자인 앨리슨 아이엘로 박사는 "상실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세포 노화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며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누적된 상실 경험이 미국인의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긴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름·흰머리·체력 저하 등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 외에도 세포·조직 수준의 정밀한 변화가 함께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며 교육 같은 사회적 요인이나 상실 경험 같은 심리·정서적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인구학(Demography)'에 최근 게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