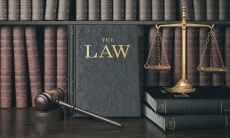어릴 적 미국 할리우드는 동경의 세계였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터미네이터’ ‘E.T.’ ‘탑건’ 같은 영화 속에서 펼쳐진 모험과 환상은 가슴을 뛰게 했다. 멋있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 울고 웃었고, 영화관을 나와서도 그 여운은 오래갔다. 영어사전을 뒤적이며 꼬불꼬불 팬레터를 써 보낸 적도 있었다. 몇 달 뒤 사인이 찍힌 배우 사진이 답장으로 날아왔을 때의 벅찬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매 시즌 쏟아지던 할리우드 영화는 재미와 스케일, 그리고 스타의 힘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1980~1990년대를 보낸 세대라면 누구나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홍콩 영화도 한때 열풍이었다. ‘네 글자 제목’의 액션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고 주윤발 스타일의 버버리 코트나 성냥개비 물기는 유행 아이템이 됐다. 하지만 수명은 길지 못했다. 캐릭터와 액션은 매력적이었지만 서사적 다양성에서 할리우드에 못 미쳤다. 할리우드가 단순히 미국 영웅주의만을 반복했다면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늑대와 춤을’처럼 서부 문명을 비판하거나, ‘어 퓨 굿맨’ 같이 국가주의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에린 브로코비치’처럼 자본에 맞서는 개인의 승리를 그리는 작품 등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했다. 할리우드는 화려한 볼거리 뒤에 ‘자유, 정의, 우정, 인간 존중’ 같은 메시지를 심어 전 세계로 전파했다. “돈이나 권력으로 복종시키지 않고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소프트파워(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를 미국은 이때 제대로 얻었다. 메시지의 힘이야말로 미국 대중문화의 진짜 자산이었다.
오늘날 세계 문화계의 관심은 한국으로 옮겨왔다. K팝 그룹들이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에 남을 신드롬이 됐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할 조짐을 보이고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창작물이 토니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냈다. 더 놀라운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메이드 위드 코리아’라는 흐름이다. 해외 창작자들이 한국 배우, 한국 음악, 한국적 정서를 끌어안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는 해외에서 열광하는 K컬처 현상이 매일같이 오르내린다. 예전 같으면 과장된 ‘국뽕’ 뉴스라 치부됐을지 모르나 이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흥행과 화제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화 상품은 속성상 늘 새롭게 소비되고 사라진다. 한국 문화가 일시적으로 소비되고 끝나지 않으려면 그 안에 메시지와 정신이 담겨야 한다. 미국 문화가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스펙터클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가 영화와 음악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K컬처가 세계의 중심에 서려면 단순히 한국어나 한국 음식 등 한국적 소재를 등장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화가 메시지를 품을 때, 그것은 소재를 넘어선 힘을 가진다. 신(新)계급 사회를 풍자한 ‘기생충’, 인간의 탐욕과 자기 희생을 동시에 드러낸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울린 것도 그 때문이다. 기억 속에 새겨지는 가치와 서사를 가질 때 문화의 생명력은 길어진다. 과거에는 ‘한’ 같은 정서를 내세워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면 경제적·문화적 저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지금은 달라져도 된다. 미래 지향성, 역동성, 성장, 개방성, 소통, 따뜻함, 화끈함 같은 오늘의 한국적 특징을 나름의 미학에 담아 새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탄생해야 한다.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회는 흔치 않다. 화려한 성과에 취하기보다 한국 문화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자문할 때다. 미국 할리우드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새로운 소재의 제공처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세계적 힘이 되려면 가치와 서사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메시지 없는 문화는 오래 가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sim@sedaily.com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