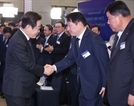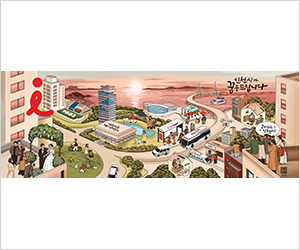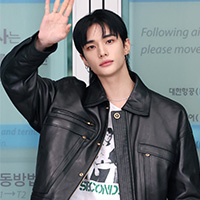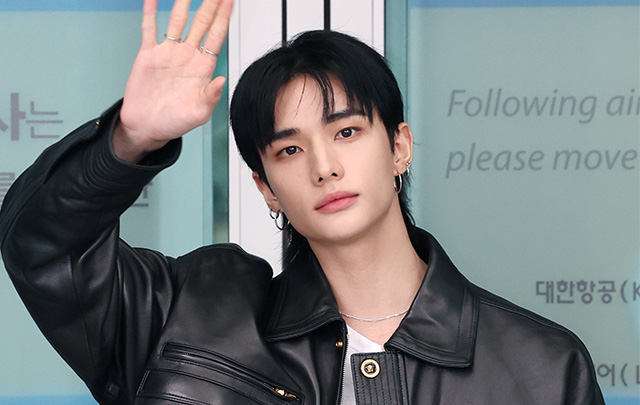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위암 환자에서 혈액을 타고 간·폐·뼈 등으로 퍼지는 ‘혈행성 전이’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적 특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기존 분류체계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전이 양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맞춤형 치료 전략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중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와 이혜승 병리과 교수 연구팀은 위암 수술 환자 64명의 종양 조직을 정밀 분석해 혈행성 전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아형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위암을 △전이 위험이 높은 ‘줄기세포성’ 아형 △상대적으로 전이 위험이 낮은 ‘위 점막형’ 아형으로 구분했다. 실제 분석 결과 줄기세포성 아형 환자의 혈행성 전이 위험은 위 점막형 대비 약 2.9배 높았다.
연구팀은 또 머신러닝 기반 생존모형을 적용해 전이와 밀접히 관련된 17개 핵심 유전자를 선별해 이를 활용한 ‘혈행성 전이 위험 점수’ 모델을 개발했다. 환자별 발현 패턴에 따라 고위험군(≥0.15)과 저위험군(<0.15)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부 코호트 3개(600명 이상)와 환자 유래 이종이식(PDX) 모델 51개를 통해 검증한 결과 고위험군에서 전이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혈행성 전이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항암 보조치료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아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국제 암세포 데이터베이스(CCLE)를 분석해 IDH1 억제제, PI4K 억제제, 산화적 인산화 억제제 등을 잠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추가 전임상·임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도중 교수는 “위암 환자에서 혈행성 전이와 직접 연관된 분자 아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환자별 전이 위험을 수치화해 조기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밀 예측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과 신약 개발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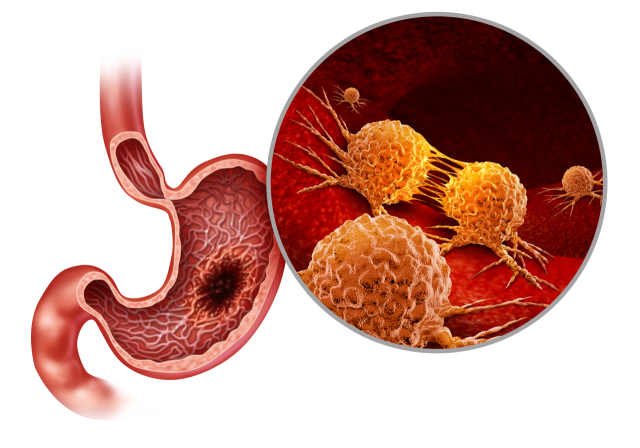
 syj@sedaily.com
sy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