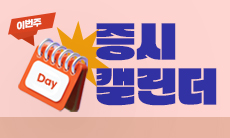뉴욕에서 현지 증시 소식을 전하다 보면 한국 개인투자자들과 미국 월가 간 시장 인식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최근 미국의 유망 투자 종목을 알아보는 한국의 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 요인에는 귀를 닫으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보다는 잃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이다. 최근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지인은 “나스닥 원전·가상자산 관련주에 덤볐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머리를 싸맸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 초 2398.94까지 내려갔던 코스피지수는 이달 3일 4221.87까지 솟구쳤다. 이 기간 상승률만 76%에 달한다. 전 세계 증시 가운데 1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을 내 투자한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증가해 이달 13일 역대 최대인 26조 2515억 원으로 불었다. 이 금액은 코스피가 폭락해 3900선까지 내려갔던 이달 4~7일 외려 폭증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낙관론은 미국 증시에도 번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21억 181만 달러(약 163조 3772억 원)였던 한국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이달 12일 1622억 2631만 달러(약 236조 4286억 원)로 73조 원 넘게 불었다.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미국 주식과 채권을 새로 순매수한 금액만 각각 282억 8876만 달러(약 41조 1743억 원), 97억 794만 달러(약 14조 1299억 원)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광풍을 넷플릭스의 생존 게임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면서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FT는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무리한 행동, 레버리지(차입 거래) 사용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일부 미국 상장사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근 월가는 시장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은 더 이상 그저 그런 뜬소문이 아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평정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을 독과점했듯 월가는 이제 AI 부문에서도 최종 승자가 될 몇몇 기업을 선별하는 분위기다.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인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최근 시장 과열을 경고하며 헤지펀드를 청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AI 기술이 테슬라를 제친 전기차처럼 미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누적된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도 불안 요소다. 올 들어 미국 내 기업 파산이 15년 만에 최다로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인 JP모건, 블랙록과 여러 지역 은행들이 잇따라 손실을 입고 있다. 관세 전쟁과 이민 정책이 부른 물가 상승, 고용 악화 문제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제대로 된 지표도 나오지 않다 보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월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도 수직 상승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1~2년간 주가가 10~20%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나란히 경고했다.
이렇듯 글로벌 시장 곳곳에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 요소가 많은데도 한국에서는 경제 부처 고위직까지 나서 주식을 저가 매수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원화 표시 자산의 가격이 올라도 월가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 힘들게 됐는데 이들의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주식 관련 신용대출 탓에 지난달에만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혹여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1%대인 한국의 관료와 국민들이 2%대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보다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주가 상승을 확신하는 게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