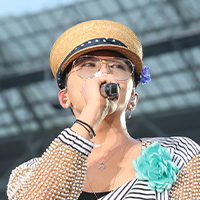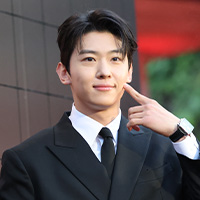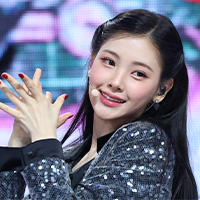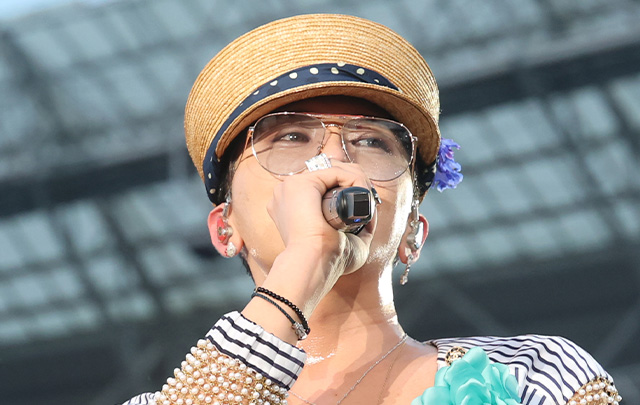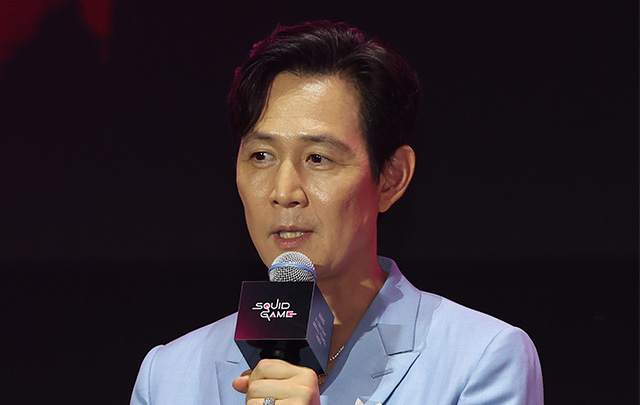By IAN BREMMER
Additional reporting by Erika Fry and Deena Shanker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견인차는 브릭스 BRICs로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투자자와 기업 탐사자들 모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높은 언덕의 금광 마을’로 여겼다. 누구든 충분히 용감하고, 기민하고, 부지런하다면 개발할 수 있는 깊고 풍부한 ‘상업의 광맥’이라고 생각했다.
브릭스 국가는 각각 다른 지리, 언어, 문화, 정치, 역사라는 높은 장벽으로 분리돼 있었지만,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인구가 많고 개발이 필요한 땅이 많아 정부가 서구기업의 투자를 기꺼이 환영하고 있었다. 영국 맨체스터 Manchester에서 집배원의 아들로 태어난 짐 오닐 Jim O’Neill에게도 그렇게 보였다. 골드만 삭스에서 세계 경제 연구 책임자를 맡은 오닐은 2001년 11월 이 거대한 4개국을 진지하게 한데 묶어 ‘세계 경제 보고서 66번: 더 나은 세계 경제 브릭스 구축(Global Economics Paper No. 66: Building Better Global Economic BRICs)’을 발표했다. 16페이지 분량의 이 평범한 고객 브리핑 문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브릭스 관련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 각종 지수, 투자회의 및 월가 리서치 팀 등을 양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 주요 기업들이 자체 마케팅 및 생산 전략을 재고하고 공급망을 수정하게 만든 한편, 방갈로르 Bangalore나 선전 Shenzhen처럼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도시에 수십억 달러의 기업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오닐에 의한 브릭스 효과가 세계 비즈니스 판도를 재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닐이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은 세계 경제 GDP의 8%(2조 7,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4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9%에 이르고 있다(2010년 브릭스 4개국이 남아프리카를 그룹에 초대하면서 브릭스의 마지막 알파벳 ‘s’가 대문자 ‘S’로 바뀌게 되었다).
2001년은 중국이 이제 막 성장 엔진의 속도를 높인 시기였다. 당시 경제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였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드는 국가는 없었다. 당시 인구 1억 7,700만 명에 유럽 대륙 크기의 국토를 가진 브라질도 스페인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이제 이들 모두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인도는 지난해 GDP 2조 달러를 돌파했다. 경제생산량이 그 5배에 달하는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니게 됐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부침은 있었지만 2000년 4.3%였던 성장률이 2010년 7.5%로 올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러시아 중산층의 규모도 두 배로 늘었다.
브릭코노믹스 BRIConomics라는 이론이 지닌 통찰력과 그 묘한 시의적절함은 분명 칭송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새천년에 접어들면서 급변했던 세계가 다시 한 번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는 지난해 거의 2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7.4%)을 기록했다. 스캔들이 많았던 브라질도 경기침체의 위기에 놓여있다. 러시아의 경우 유가 급락과 경제제재 외에도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겹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는 올해 -3.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오닐과 그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팀은 이들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을 유지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도입’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럴 능력이 있어야만 예상 장기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관리가 잘 이뤄질 경우에만 이들 신흥강국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브릭스 국가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런 곳은 많지 않다. 10년 전만 해도 신흥시장은 거의 모두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다. 10여 개 국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각국 정부는 호시절이 이어지는 데 만족감을 나타냈다. 모든 것이 잘될 때에는 어려운 개혁이 전혀 필요 없다. 중산층이 증가했고, 삶의 질도 계속 개선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갔다. 갑자기 개발도상국 가운데 관리가 잘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개도국 정치 지도자들은 성장이 둔화됨과 동시에 잘못된 정책과 부패, 형편없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높아지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13년 발생한 터키와 브라질의 시위는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난 유사한 정서를 보여주었고, 그 압박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Xi Jinping 주석의 개혁으로 성장세가 조금 꺾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강력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며, 수익을 낼 기회도 많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와 시 주석이 기득권층의 이익과 특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맞게 될 역풍을 감안하면, 정치·경제적 혼란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를 위해 주목할 곳은 어디인가? 이는 그들이 모색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바로 안정성과 회복력이다. 포춘은 이런 조건을 갖춘 7개국을 찾아보았다. 요약하면, 이들 시장은 건전한 정부 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곳들이다.
지난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를 실각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재능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했다. 양국 모두에서 진정한 개혁이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말레이시아의 현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경제 관리를 약속하는 신뢰할 만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세 국가 모두 앞으로 몇 개월간 지역 내 갈등이 많지 않을 전망이라 상황이 좋은 편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내수경제 개혁이 의제로 올라 있다. 이 아시아 양대 강국의 지도자들은 경제 안정성에 해를 끼칠 갈등을 피하려 할 것이 뻔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역 내 정치·경제적 영향력 경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점이다.
전망이 밝은 또 다른 곳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 현재 세계에서 중산층의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은 보통 아프리카를 원유·천연가스·금속·광물 수출 대륙 정도로 여기지만, 전 대륙에 걸쳐 서비스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정부 관리(governance)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2013-14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규제 개선의 효과가 더 큰 곳으로 꼽은 바 있다. 그중 케냐가 가장 전망이 밝은 국가다.
마지막으로 성장이 고르지 않은 지역 중에도 개선된 정부 관리를 통해 투자가치를 제공하는 신흥시장이 있다. 중남미와 멕시코,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물론 브라질과 칠레도 제공할 수 없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올 들어 유럽에선 유로존 추가 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흔들리고 있다. 여러 이슬람 급진 단체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이 이끄는 러시아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 중 폴란드만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한데 묶을 멋진 약칭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또 5년 후의 전망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포춘이 제시하는 ‘러키 세븐 국가’들이다.
India 인도
최근 변화가 찾아온 인도는 브릭스 국가 중 유일하게 계속 기대를 걸 만한 곳이다. 야당의 방해로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의 탄탄한 권력과 여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의 선거 승리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본질적인 구조변화가 결국은 이뤄질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선 노동·환경 관련 규제의 자유화가 새로운 투자 관련 금융혜택과 맞물리고 있어 제조업 분야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당국에서도 정책수정을 통해 제조업, 탄화수소 산업, 보험, 국방 및 철도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추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절망적으로 낮아졌던 경제성장률이 상승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도 새 얼굴이 등장했다. 지난해 포춘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은 이미 고비용의 연료 보조금을 삭감했다. 행정부에서도 석유 및 천연 가스 분야에 기업 친화적 변화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삭감으로 생긴 여유자금은 야심 찬 인프라 개발계획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노동자 생산성도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 중산층의 급격한 확대는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원광(raw-ore) 수출 금지정책의 철폐 같은 대규모 추가 개혁을 반대하는 저항이 존재하지만, 유권자들은 더 나은 정부관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걸고서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Malaysia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현 정부가 변화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연료 보조금을 폐지한 나지브 라자크 Najib Razak 총리는 오는 4월에는 6%의 재화 및 서비스 세금을 도입해 정부 재정상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나지브 총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을 도입, 자신의 경제 변혁 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추가 자유화도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이러한 침체가 말레이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지브 정부는 인프라,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지출 확대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상대로 당국이 광범위한 재정개혁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경우, 중산층의 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국가 균형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Mexico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 대통령이 집권한 2012년 12월 이후, 멕시코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에너지업계, 노동시장, 통신분야, 교육체계 및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왔다. 또 2015년과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과 고속도로, 항구 등의 건설과 운영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기회가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의 확장으로 이득도 보게 될 것이다. 국경 북쪽 경기가 살아나면 더 많은 여행객이 멕시코를 찾을 것이고,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인의 본국 송금규모도 커질 것이다.
Colomb ia 콜롬비아
포춘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좌파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과 올해 말까지 평화협상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법치주의를 확대하고 소외지역 개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산토스 정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는 정쟁이 기업활동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Poland 폴란드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보다 더 큰 영향력을 얻은 유럽 국가는 없었다. 훌륭한 정부가 전망 밝은 신흥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여당인 시민연단(Civic Platform Party)은 올해 선거 후에 연정 제1당으로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 자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 국가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장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방 및 에너지 분야 구조 개혁과 정부투자 가속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Kenya 케냐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제규모가 큰 아프리카 국가들은 요즘 스스로 감당할 몫 이상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케냐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 양원 모두를 장악한 여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후루 케냐타 Uhuru Kenyatta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전력발전과 인프라 부문 개발계획 추진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케냐타 정부는 최근 발생한 테러공격 후 국가안보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케냐타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안정성도 더 높아졌다. 중앙은행 및 재무부 운영에 대한 IMF 개선방식이 케냐에 적용되면, 물가상승률 제어와 더불어 통화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기회
By Jen Wieczner
거대 펀드업체 인베스코 Invesco에서 신흥시장 채권 부문을 이끌고 있는 라시크 라만 Rashique Rahman은 “지금은 시장 다분화의 시대”라며 “신흥국들을 하나의 큰 붓으로 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나 브라질처럼 과거에 강력했던 경제 강국은 원자재 가격하락과 미국 달러 강세로 고전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작은 몇몇 주변국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또 저유가로 이득을 보고 있다). 포춘이 지금 투자할 만한 최고의 신흥시장 세 곳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인구 2억 5,300만의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다. 거대한 중산층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저유가의 혜택도 톡톡히 보고 있다. 개혁 추진 의지가 분명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가 예산개혁과 부패 근절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겐 장점이 많은 투자처임에 분명하다. 티. 로우 프라이스 T. Rowe Price에서 39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성장 주식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공동 관리를 맡은 제이 노구에이라 Jay Nogueira는 ‘인도네시아의 제이피모건’인 뱅크 센트럴 아시아 Bank Central Asia와 현지 사업 규모가 큰 네덜란드 소비재 대기업 유니레버 Unilever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멕시코
미국 남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국가에서도 개혁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 국영 에너지 산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악명 높았던 통신시장 독점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멕시코는 중국이 보유했던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차지할 기세다.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2014년 말까지 이 지역 주식 가치를 높였고,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이 매도 분위기일 때 MSCI 멕시코 지수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려놓기도 했다. 하딩 로브너 Harding Loevner에서 89억 달러 신흥시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릭 슈미트 Rick Schmidt는 하이네켄 Heineken 지분 20%를 소유한 멕시코 콜라 생산업체 펨사 Femsa를 비롯해 칸쿤 Cancun 공항을 운영하는 아수르 그룹(Grupo Aeroportuario del Sureste, ASUR)을 선호한다.
폴란드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IMF가 내놓은 예상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2015년 성장률을 3.3%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서유럽 지역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전쟁 분위기 등 주변국의 경제적 악조건 여파로 최근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투자자들은 빠르게 현대화가 진행 중인 폴란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라 저유가도 도움이 되고 있다. 폴란드의 뱅크 페카오 Bank Pekao에 투자한 슈미트는 “폴란드는 전형적인 신흥시장이다. 여전히 시골 지역이 기반이지만,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중산층 인구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