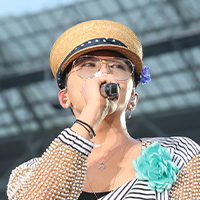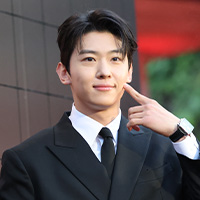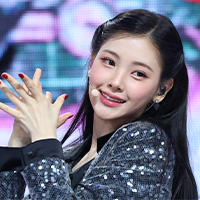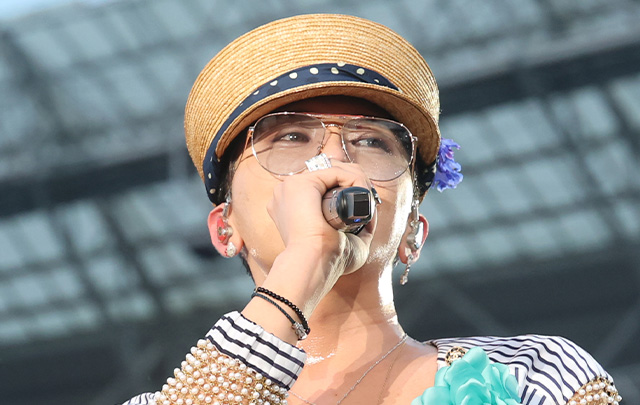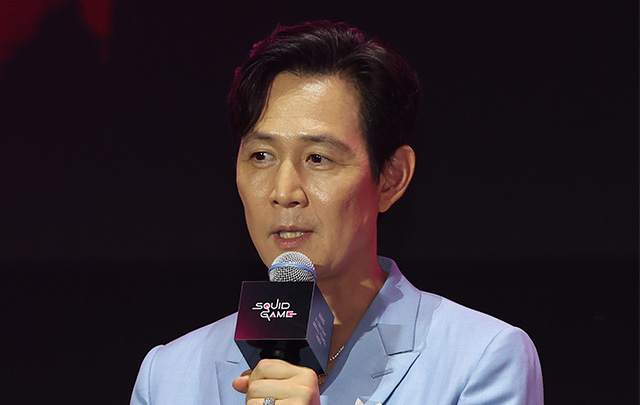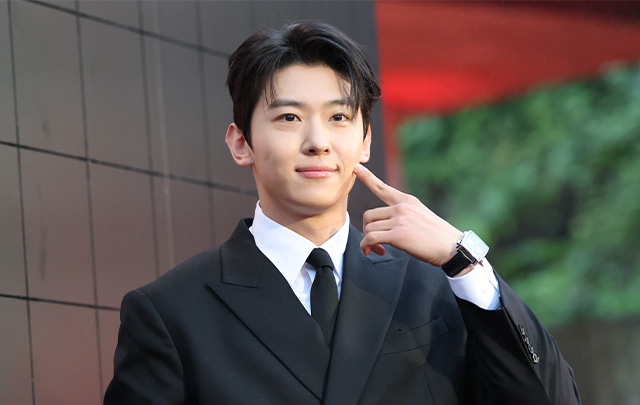세비니의 발표는 지난 3월 20일 국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에서 진행됐다. 그 하루 전, 바클레이즈Barclays , 시티그룹 Citigroup, RBC 캐피털RBC Capital 에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Credit Suisse Group 이 바이오젠의 예상 주가를 두 달도 안 돼 주당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수정한 상황이었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Cambridge 에 본사를 둔 바이오젠의 주가는 당시 428달러였다.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aducanumab 관련 연구 결과가 투자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작년 12월 초에 비해 41%나 오른 것이었다. 세비니의 학회 발표 주제가 바로 이 신약이었다. 이후 3개월간 이어진 주가 상승으로 바이오젠의 시가총액은 290억 달러나 증가했다.
어떤 의미에선 새로울 것 없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과학자, 투자자, 생명공학 전문 기자 등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니스의 애크로폴리스 컨벤션 센터 Acropolis Convention Center에서 진행된 세비니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다. 참가자들은 발표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앞다퉈 스마트폰으로 세비니의 PPT를촬영하고, 관심을 끌 만한 데이터와 단평을 곁들인 트윗을 분주하게 올렸다.
이유는 분명했다.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뇌반(班,plaque)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환자들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춰주는 약이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되도록 흥분하지 말자며 애써 억누르려는 어색한 분위기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이었다. 이 병은 그동안 수많은 유망 신약이 모두 정복에 실패한, 의료계의 최대 난적이었다. 지난해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 의 한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2012년 동안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을 한 합성물질 244종 가운데 단 한 개만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14종은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승인율이 0.4%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암치료제의 경우는 19%다.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알츠하이머 약물은 총 5종에 불과하고, 이 중 4종이 현재 이용 가능한상황이다. 모두 병 자체보단 기억상실 등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어느 것도 효과가 특별히 높진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현재 미국의 10대 주요 사망 원인—이 병은 현재 6위다—가운데 유일하게 예방이나 치료는 물론, 진행 속도를 완화할 방도조차찾지 못하고 있는 질병이다.
바이오젠이 실험 중인 아두카누맙(이하 ‘아두’) 항체처럼 베타아밀로이드에 작용하는 경우는 특히 결과가 나빴다. 베타아밀로이드란 일종의 손상된 단백질로, 축적될 경우 뇌반이 돼 신경세포를 괴사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워낙 성공 사례가 없다 보니 베타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주범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이들도 생겼다. 그동안 70종 이상의 반(反)아밀로이드 물질이 실험을 거쳤다. 일라이 릴리Eli Lilly 와 로슈 Roche 외에도 엘란 Elan , 화이자 Pfizer , 존슨 앤드 존슨 Johnson & Johnson 세 회사의 합작 프로젝트 등 여러 유명 제약회사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종도 성공하지 못했다. 펀드평가사 모닝스타Morningstar 소속 애널리스트 캐런 앤더슨 Karen Andersen 은 “예전에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바이오젠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만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기엔 충분치 않다는 듯,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졌다. 바이오젠의 아두 연구는 적정 투약량 결정 및 안전성 검증 사전 조사가 이뤄지는 1b상(phase) 시험 단계였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시험에 참가한 환자 수는 166명 정도에 불과해 확실한 결론을 얻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또 아두를 가장 많이 투약한 환자와 가장 큰 효과를 보인 환자들은 한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뇌출혈이었다.
그러나 3월 20일, 나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젠의 주가는 크레디트스위스의 전망과 그리 큰 차이가 없는 476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니스에서 있었던 학회 발표 며칠 후,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두—판매승인은 아무리 일러도 몇 년 후에야 날 수 있다—의 향후 연 매출이 최대 8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월가에서 제시된 다른 예상치들은 이보다도 훨씬 높았다.
알츠하이머 학계는 일부 투자자들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상당수 연구 학자들의 아두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인 신약 시험에 비해 훨씬 열광적이었다. 이 기사의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학계 및 제약회사 소속 연구자 25인 중 바이오젠의 연구 결과에 흥분하지 않은 이는 드물었다. 배너 알츠하이머 연구소(BannerAlzheimer’s Institute)의 에릭 레이먼Eric Reiman 소장은 “아두의임상 효과가 증명된다면 알츠하이머 연구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아두가 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하버드 의대의 브라이언 배스카이Brian Basckai 교수는 “알츠하이머 연구사상 가장 성공적인 임상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듀크대의 신경인지장애 프로그램을 이끄는 P. 무랄리 도라이스와미P. Murali Doraiswamy 교수도 “바이오젠의 연구에 개인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학계에) 작은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명 바이오 전문 블로거는 학계가 ‘희열(euphoria)’에 빠졌다고 전했다.
경쟁 업체들마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화이자의 신경과학 부문 최고과학경영자(chiefscience officer) 마이클 엘러스Michael Ehlers 는 바이오젠의 연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업계의 연구 중 최대 발견이라 평가했다. 많은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아두는 알츠하이머 연구자 전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할 수 있다. 실패와 잘못된 출발로 점철된 긴 시간이 이제 끝나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 뒤에는 사실 하나가 아닌 두 회사가 있다. 한 회사는 바이오젠이다. (다른 회사가 개발한) 한 종의 신약에 초대형 도박을 감행했고, 이 분야 후발주자이지만 엄청난 투자를 받아 놓은 상태다. 다른 한 곳은 자체 연구소 주도로 26년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알츠하이머 정복에 도전한 139년 역사의 제약업체 일라이 릴리다. 이들의 이야기는 제약업계판 ‘토끼와 거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반전이라면, 지금까진 토끼가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알츠하이머병은 개인의 기억과 자주성에 내려지는 점진적인 사망 선고다. 매년 미국에서만 530만 명이 이 끔찍한 병에 걸리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로 2025년이 되면 이 수치는 8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쯤이면 전체 인구가 약 25% 늘어, 알츠하이머 환자 수도 거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병이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질병이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해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비는 총 2,14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케이드 Medicaid 에서 부담했다. 미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s Association)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연간 치료비용이 1조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제약회사는 알츠하이머 정복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성공할 경우 지금까지 잠겨 있었던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1989년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포스트 닥터 연구원이었던 패트릭 메이Patrick May 가 입사할 당시에도 릴리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약 1세기 전,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 는 여성 환자 아우구스테 데터 Auguste Deter 가 보이는 독특한 정신 상태에 주목했다. 51세의 데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신 퇴행 증상을 보였다. 당시엔 노망이 드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겼다.
그러나 전부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 데터는 너무 젊었다. 가끔 정신이 맑아졌을 땐 알츠하이머에게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1906년 데터가 사망하자 알츠하이머는 그녀의 뇌를 부검했다. 데터의 뇌는 크기가 상당히 줄었으며, 조직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신경 내부 및 주변 이곳저곳에 반점이 두드러져 있었다. 현재 알츠하이머의 상징이 된 이 반점은 훗날 연구 결과 아밀로이드 반(amyloidplaques), 신경섬유매듭(neurofibrillary tangles) 혹은 타우tau 로 불리는 물질로 밝혀졌다.
이렇듯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알츠하이머병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70년이 지난 후 에야 알츠하이머가 희귀병이 아니라, 흔히 발견되는 치매의 주요원인임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Prozac 으로 현금이 두둑해진 릴리는 그때부터 알츠하이머 연구에 투자를 시작했다. 1995년에는 치매 환자의 기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노멜린 xanomeline 이라는 분자물질을 개발했다. 릴리의 마케팅부서는 자노멜린의 성공을 확신한 나머지, 독일 바이에른주 마르크트브라이트Marktbreit 에 위치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어린 시절 집을 구매하자고 경영진을 설득하기도했다.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이 별장에서 신약 발표 행사를 연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자노멜린은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초기의 신약 후보들은 알츠하이머 박사가 환자의 뇌에서 발견한 두 가지 비정상적인 요소, 즉 아밀로이드와 타우 공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40년간의 연구에도, 두 요소가 알츠하이머 발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 확실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폭넓은 지지를 얻는 학설은 일명 ‘아밀로이드 가설’이다. 정상 상태에선 뇌 속을 순환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과다분비 혹은 뇌의 노폐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한자리에 쌓이면서 병이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신경세포 주변에 뇌반이 형성되고, 시냅스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세포 활동이 저하된다. 그 결과 신경세포 내에서 기본적인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타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뇌반과 타우의 ‘매듭’이 점점 많아지면, 신경세포가 괴사하고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이 점차 불가능해진다.
패트릭 메이는 이 가설을 처음으로 학계에 제안한 학자 중 하나였다. 일찍이 그의 팀은 LY-411575라는 화합물을 발견했는데, 쥐 실험 결과가 워낙 좋았던 터라 메이는 의학 교과서에 실릴만한 발견이라 확신할 정도였다. 그러나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위장관이 점액으로 꽉 차는 부작용이 발생한 탓에 연구는 종료되었다. 이후에도 유망해 보였던 반(反)아밀로이드 분자물질의 동물실험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임상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오랜 노력 끝에, 세마가세스타트semagacestat 가 등장했다.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 역사상 최초로 찾아온 진정한 기회였다. 까다로운 각종 초기 시험을 통과했고, 피부 발진 외의 부작용은 없는 듯 했다. 2008년 입사 후, 거의 20년 만에 메이의 팀은 릴리 역사상 최초로 대형 알츠하이머병 3상 임상시험을 했다. 제3상 시험은 인체 대상 시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대규모 단계로, 21개월간 31개국에서 2,600명이 이 시험에 참가했다.
시험이 시작된 지 몇 년 후, 연구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던 외부 담당자가 릴리 측에 연락을 취해왔다. 세마가세스타트를 복용하던 참가자들의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위약 복용자들보다 낮다는 소식이었다. 약이 오히려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임상시험은 그렇게 끝났다.
당시 릴리의 의료부문 책임자로 알츠하이머병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에릭 시머스Eric Siemers 는 이때를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약효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몇 달 전에 메이는 갑작스레 아내를 잃었다. 그는 21년간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모습을 아내가 보지 않아도 된다는게 당시로선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말했다. 메이는 “세상이 무너지는기분이었다”며 “말 그대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이 2010년 7월 조지 스캔고스George Scangos 가 바이오젠의 CEO에 올랐을 당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연구의 현실이었다. 생물학자인 그는 포스트 닥터 과정 당시 세계 최초 유전자 변형 쥐 개발로 뉴욕 타임스 헤드 라인을 장식한 바 있다. 이후 교수로 재직하다가 80년대 말에 바이오기술업계에 합류했다.
바이오젠은 연구보단 경영상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바이오젠은 여러 분야에 조금씩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연구는 총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바이오젠보다 네 배는 큰 회사에나 적합할 구조였다. 그는 당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온종일 회의가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바이오젠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바이오기술 업체로, 획기적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여럿 개발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스캔고스는 이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쟁 업체들이 훨씬 앞서 있었던 종양학 및 심혈관 질환 부문은 투자를 지속할 이유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연구를 중단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 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바이오젠은 스위스 업체 노이리무네Neurimmune 가 찾아낸 반아밀로이드 항체 아두카누맙에 집중하는 상황이었다.
알츠하이머는 부담 없이 손댈 만한 분야가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훨씬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업체들도 쩔쩔매게 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는 바이오젠의 사업 계획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질병이 아니었다. 바이오젠 외에도 릴리와 화이자 등 최소 4개 업체가 아밀로이드 단백질 항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바이오젠이 다섯 업체 중 꼴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약 1종의 개발에는 평균 15억 달러의 비용과 15년의 연구기간이 소요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시장에 약을 출시하지도 못한 채 끝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였다. 업계는 여전히 2001년 아일랜드 제약업체 엘란(이후 OTC*역주: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 제약업체 페리고 Perrigo 에 인수됐다)에 닥쳤던 재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엘란은 뇌반에 대한 면역반응을 높일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해 임상시험 참가 환자들에게 특정 형태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주사했다. 참가자 중 6%에서 뇌와 척추에 발생하는 심각한 염증인 수막뇌염이 발생하면서 그 실험도 실패로 돌아갔다.
연구자들은 이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밥티스트(BAPtist)와 타우의 전망이 더 밝다고 믿는 타우이스트(tauist), 두 그룹으로 갈리고 있었다. 아밀로이드 신약이 실패할 때마다 분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목표 때문에 연구진의 노력과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낭비됐다’ 며 알츠하이머 연구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평론가의 비판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스캔고스는 14년 전, 바이엘Bayer 에서 일할 때 잠시 알츠하이머를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 내게 전문적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었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래도 판단은 내려야 했다.”
그때 앨 샌드록Al Sandrock이 나타났다. 큰 체구에 부스스한 검은 머리, 어딘지 괴짜 과학자의 분위기가 나는 사나이였다. 바이오젠의 신경학 R&D 분야를 총괄하는 샌드록은 신임 CEO에게 아두를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아두는 건강 상태가 매우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빠른 스위스 노인들로부터 기증받은 면역세포 속 유전정보에서 추출된 항체였다. 기증자들이 고령에도 두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같은 이치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능력 저하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논리가 아두에 깔려 있었다.
바이오젠의 연구자들도 유사한 화합물을 개발하려 노력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샌드록은 “우리는 쥐 면역력 강화부터 시작해 여러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취리히에 있는 내 친구 로저Roger 는 우리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화합물을 환자들로부터 곧장 뽑아내고 있었다!”
아두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밀로이드반에 잘 달라붙었고, 고령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밀로이드반이 대폭 감소했다. 바이오젠은 노이리무네에 사용료를 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개발 및 상용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인체에서 추출한 것인 만큼 흥미로운 상황이 여럿 발생했다. 아두를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쥐화(化, mousify)’해야 했다. 쥐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항체를 인체에 맞추는 일반적인 개발 과정과 정반대였다.
하지만 사내에 아두에 대한 샌드록의 기대에 공감하는사람은 드물었다. 알츠하이머 쪽으로의 진출은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항체가 과연 좋은 접근법인지부터가 의문이었다. 아밀로이드반에 도달하려면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역주: 뇌척수액과 혈액을 분리하는 장벽)을 뚫어야 하는데, 항체가 그러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두의 성공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확신은 중요하지 않았다. 스캔고스가 샌드록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스캔고스는 “CEO의 역할 중 하나는 휘하의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재능, 솔직함, 진실을 말하는 태도를 갖춘 직원, 과학·의학적 감각이 뛰어난 직원의 말을 믿고 도박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후로 몇 년간, 경쟁사가 개발 중이던 아밀로이드 항체 4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거나 임상시험 단계에서 중단됐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확신했던 샌드록조차 부담을 느꼈다. 그는 “회사 안팎에서 많은 연구자가 아밀로이드 가설이 틀렸다며 나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캔고스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데이터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있었다”며“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왜 안 풀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두 개발팀은 왜 경쟁 항체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들은 세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신약을 실험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경쟁 항체가 실제로 목표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공격했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신약시험 시점이 너무 늦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다.
스캔고스가 그 후 진행한 아제이 베르마Ajay Verma 의 영입은 CEO로서 내린 훌륭한 결정이었다. 활기찬 성격의 베르마는 노바티스Novartis 와 머크 Merck 에서 근무한 바있는 신경학자다. 그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진화 관련 용어를 섞어 가며 뇌 질환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들은 그를 제임스 본드 영화에 등장하는 두뇌파 발명가 ‘Q’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실험의학 담당 부사장이다). 베르마의 팀은 아두를 실험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베르마의 첫 임무는 임상시험 참가자 전원을 알츠하이머 환자로 구성하는 것인데, 그 일은 예상과 달리 쉽지 않았다. 극히 최근까지도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는 (1906년 아우구스테 데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생존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의료진이 치매 진행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환자 가족 및 친구들의 증언이나 정확도가 다소 부족한 심리진단 결과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다른 종류의 치매를 앓는 환자를 오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베르마는 바이오젠의 환자 심사 절차에 떠오르고 있는 주요 신기술을 한 가지 도입했다. 아밀로이드 침전물(최근에는 타우도 가능)을 정확히 구분하고, 병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갖춘 영상 장비였다. 이 장비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바이오젠의 아두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40%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지만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뻔한 말 같지만, 반(反)아밀로이드제는 뇌 속에 아밀로이드 침전이 없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릴리의 솔라네주맙 solanezumab 임상시험이 실패로 돌아간 한 가지 원인이 이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릴리는‘솔라’의 대규모 제3상 임상시험이 끝난 후에야 참가자 중 25%의 뇌 속에 아밀로이드 반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두가 목표에 정확히 작용하는 것이 두 번째임무였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영상 기술이 다시 한 번 필요했는데, 역설적이게도 릴리가 보유한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역주: 특정 물질 추적에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1상 임상시험은 신약의 적정 투약량을 정하는 초기 단계이지만, 바이오젠은 이 단계에서 과감하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높은비용이 드는 영상 촬영을 하는 혁신을 감행했다. 아두의 1상 임상에서지원자 166명은 수차례의 MRI 촬영, 뇌 포도당 PET 촬영, 요추천자 *역주: 척추 아래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검사등 수많은 검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진정 획기적인 변화는 그다음 단계였다. 이번에도 릴리의 임상시험 실패에서 얻은 교훈에 힘입은 바가 컸다. 뇌 손상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극초기 단계 환자들에게 아두를 투약한 것이었다.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아밀로이드는 본격적으로 알츠하이머 증세가 발현되기 약 15년 전부터 환자의 뇌에 쌓인다. 이 발견은 그간 신약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늦은 투약 시점 탓인지도 모른다는 벼락같은 깨달음을 학계 전체에 가져온 일대 사건이었다.
아두 임상시험은 학계를 흥분시켰다. 이 시험은 증상이 약한 환자나 아직 조짐만 보이는 단계, 일명 전구기(前驅期)의 환자들에게 조기치료가 유효함을 입증했다. 약효를 수치화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는데도, 아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기억력 및 지적 능력의 감퇴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의 투약 치료를 받은 참가자들은 위약이 투약된 대조군과 비교해 인지검사 점수가 현저히 높았다. 물론 실험 참가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그리고 실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증상이 명백하게 호전되었다는 사실과 아밀로이드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시험 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게 됐다.
자신들도 믿기 힘들지만, 그건 사실이라는 게 바이오젠 연구진의 생각이다. 2011년부터 바이오젠의 R&D를 이끌고 있는 더그 윌리엄스 Doug Williams 는 “솔직히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데이터가 딱딱 들어맞았다. 약효가 투약량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위약도 기대한 효과를 냈다. 어떤 방식을 써도 다 제대로 돌아갔다.”
경쟁업체 임원들조차도 상당수가 깨달음의 기쁨을 느꼈다. 만약 바이오젠의 실험 결과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흔치 않은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예방약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사람들은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스태틴 statin 을 찾듯 신약을 복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의 수익성은 놀라울 정도로 높을 것이다. 미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Agi ng · NIA)는 해당 이론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연구의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듀크대의 도라이스와미 교수는 학계 전체에 활기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제는 4~6년, 예방약은 10년 정도 복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익성이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니스에서 발표가 진행되기 3개월 전인 작년 12월, 바이오젠은 아두의 임상시험 단계를 1상에서 3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3상은 실험에 참가하는 환자 수가 더 많고 비용도 크다. 하지만 또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은 아두의 실제 시장 출시는 2018년에야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4월 말 현재 바이오젠의 주가는 423달러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릴리는 솔라의 제3차3상 임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병세가 양호한 알츠하이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NIA도 솔라의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중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환자에게서 인지 개선 효과가 약간 발생했다. 솔라 또한 2018년쯤 출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두 회사는 모두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 바이오젠의 윌리엄스 수석 부사장은 “판돈을 네 배로 늘리는중”이라고 비유했다.
전문가들은 이 약들이 모두 출시 허가를 받더라도 시장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 개인의 체질에 큰 영향을 받는 복잡한 질병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암처럼 알츠하이머 치료도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요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어쩌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둘의 공동 우승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BY ERIKA FRY
ILLUSTRATION BY SINELAB
PHOTOGRAPHS BY BOB O'CONNO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