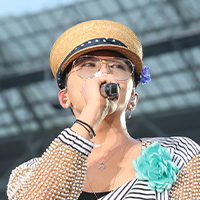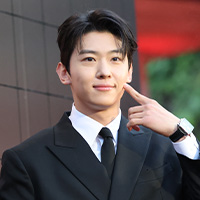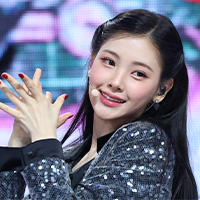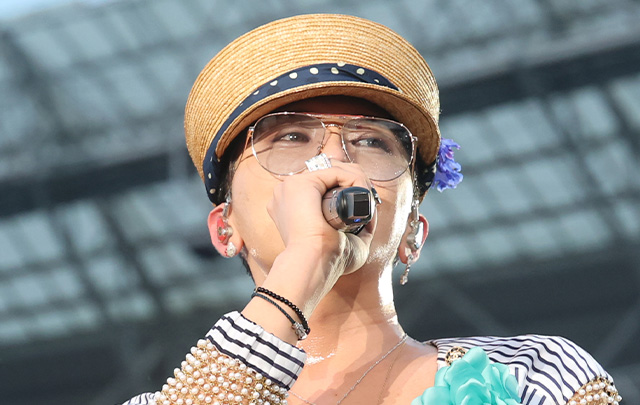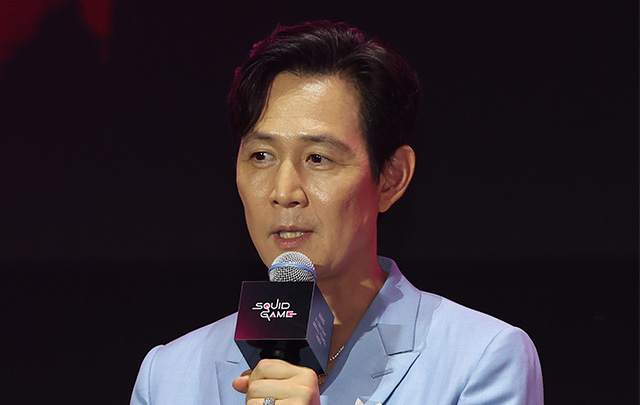그리니치의 황금빛 해안에 위치한 고급가옥들을 보면, 이 곳이 미국의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존스가 2년 전, 증가하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장소이다.
올해 60세인 존스는 45억 달러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날, 그는 심신치유 의학의 대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디팍 초프라 Deepak Chopra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초프라는 존스의 아내 소니아 Sonia-호주 출신으로 요가 및 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를 통해 월가의 거물 존스를 알게 됐다. 초프라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 참여했고, 대중의 분노를 보았지만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존스와 함께 미국의 사라져가는 중산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는 동안, 초프라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 정당한 자본 및 원인 분석 마케팅(Just Capital & Cause-Driven Marketing)’ 강의 도중 한 학생이 제시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직원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지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장 주도 접근법(a market-driven approach)’인 이 개념은 존스의 마음에 와 닿았다. 한때 면직물 무역업을 했던 그는 1980년 튜더 투자 회사( Tudor Investment Corp.)를 설립했고, 1987년 주가 대폭락을 예견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재 138억 달러를 운용하는 그는 “‘멋진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존스는 빠르게 조사에 들어갔다. 가치에 기반해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고 난 후, 그는 놀라기도 했고 약간의 당혹감도 느꼈다. 사회적 책임 투자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으며, 이미 이 시장 규모가 6조 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헤지펀드 거물에겐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니면 ‘사회적 책임투자가 더 많은 부를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포춘 500대 기업에게 압력을 넣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라는 게 존스의 판단이었다. 그는 웃으며 “정말 내가 무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존스는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바로 경쟁이었다. 미국 상위 1,000개 기업을 선정할 때, 왜 월가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이익 대신, 실제 경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인가? 그가 생각해낸 기업순위가 주목을 끌게 되면, 기업들은 서로 높은 순위에 오르고자 경쟁할 수도 있다.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 기업들은 더 공정하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존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초 초프라의 컬럼비아 대학 강의에서 영감을 얻어 저스트 캐피털 Just Capital 이라는 이름의 비영리기구를 설립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좋아하는 점이나 싫어하는 점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저스트 1000Just 1000이라는 이름의 명단은 2016년 가을 첫 공개될 예정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그 동안 의견을 밝히지 못했던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싶었다. 이 리스트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투명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바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의론자들은 과연 이 간단한 리스트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존스는 여론이 강력하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 또 대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일이 ‘폭포효과 (cascad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우린 미국 재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규모에 대해 말하곤 한다. 이 비영리기구는 내가 그 동안 참여했던 조직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기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51개 기업에 대해 살펴보려면, 지난 호에 실린 ‘세계를 변화시킨 기업 리스트(Change the World list)’를 참조하라).
처음부터 존스는 저스트 캐피털의 대부분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했다. 그는 이 기구를 운영하는 데 연간 500만~6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비영리기구가 자기조달 자금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컨대 기업들에게 저스트 1000 리스트 기업 순위를 분석하는 툴을 판매하거나, 특허계약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우리가 저스트 1000 명단에 들다니! 기념패를 만들자’고 할지도 모른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저스트 캐피털은 기업 기부금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존스는 이 비영리기구의 이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디팍 초프라부터, 허핑턴 포스트 Huf f ington Post의 창립자 아리아나 허핑턴 Arianna Huffington, 사모펀드 회사 워스레이 캐피털 Wersray Capital의 전 회장 레이 체임버스 Ray Chambers, 셸 Shell의 전 임원 존 호프마이스터 John Hofmeister, 신발 한 켤레를 사면 개발도상국에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시스템으로 유명한 톰스 슈즈 Toms shoes의 창립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Blake Mycoskie, 윤리적 기구 퓨마 비전Puma Vision 공정하고, 정직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추구한다-을 창립한 퓨마 전 CEO 조헨 자이츠 Jochen Zeitz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존스는 반 농담조로 “다들 마음이 너그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계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전임 CEO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관점들이 모여도, 기존 체제가 균형을 잃었다는 존스의 굳은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우리는 인도주의를 희생해 사업에서 돈을 벌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와 기업 이사회에서 올바른 가치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존스는 많은 이들이 ‘왜 억만장자 투자자가 갑자기 서민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진심 어린 걱정일까? 그러나 그는 타인을 보살피는 일이 그의 DNA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존스는 멤피스 Memphis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기독교 가치를 강조했으며, 그에게 ‘사회로의 환원’이라는 열망을 불어넣었다. 존스는 경제 신문사를 운영했던 부친이 회사규모가 작았음에도, 직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지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는 일생을 바쳐 회사를 위해 일한 직원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1988년 존스는 뉴욕의 빈곤 퇴치를 위해 로빈 훗 재단(Robin Hood Foundation)을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 이 재단은 연간 2억 달러를 모금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존스의 헤지펀드 업계 동료들이 기부한 돈이다.
지난 봄 존스는 테드 토크 Ted talk에서 더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 강연은 130만을 상회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당당히 나서 빈부 격차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모습 때문이었다. 특히 많은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낸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그는 “최상위층과 최빈곤층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더 높은 세금, 혁명, 그리고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하나도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가? 저스트 캐피털의 임원인 허핑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카고 총기 사건을 살펴보면, 어떤 지역은 마치 제3국의 도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볼티모어 도심지역의 폭동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상황이 어떠한가? 모든 것이 분열되고 있다. 우리는 문 밖에서 경호원들이 지켜야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허핑턴은 빈부격차가 극단 정치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변화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다음테러 공격이 마지막 테러 공격과 똑같은 형태로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의 또 다른 원인은 사라져가는 미국 중산층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존스가 테드 토크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삶의 질, 즉부, 기대 수명, 문맹률, 사회 이동성 등을 다른 21개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로 꼴찌였다. 서민의 실질 임금은 지난 40년간 나아질 기미가 없었는데 반해, 상위 1%의 임금은 그야말로 폭등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같은 기간의 생산성은 80%가 증가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연준은 이런 실상을 잘 보여주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47%는 갑작스럽게 400달러를 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무언 가를 팔거나 융자를 내지 않고 이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붕에 물이 새서 보수하다가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존스는 ‘이러한 현상을 바꾸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이 방법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솔직히 내가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내가 높은 세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 지출이 세금만큼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간 분야를 통해 부를 재분배한다면, 재정적 수단을 통한 부의 재분배보다 5배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높은 세금, 예를 들어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8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세금 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최근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 Thomas Piketty가 제시한 의견이다.
현재 미국 기업의 이익률은 11.5%로,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존스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기업들은 임원진에게 거리낌없이 전례 없는 후한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은 2014년 CEO의 평균 임금이 평균 직원의 임금보다 373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몇 배나 높아진 수치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8월 초 승인한 새 규칙에 따르면, 공기업들은 CEO에게 제공한 평균 연보수를 직원들의 평균 보수와 비교해 SEC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들에 대한 CEO의 의무는 어떤가? 존스는 직원들을 잘 대우하는 기업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더 나은 재정 실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가 좋은 예이다. 직원들에게 후한 보건 혜택을 제공하는 이 회사는 최근 온라인 대학 교육 비용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스타벅스 주식은 156.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S&P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58.7%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월마트, 타깃, TJX, 맥도널드 같은 기업들도 직원들의 보수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A에서 시애틀, 뉴욕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들도 최저임금을 시급 7.25달러에서 두 배 높은 15달러로 책정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좋은 시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존스는 그가 작성하는 명단이 이 같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얼마나 공정한가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 순위를 매긴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존스는 ”공정한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요즘 내가 밤새 고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리스트는 환경 지속가능성, 경영진의 윤리, 기업 제품의 질, 가격과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저스트 캐피털의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가’라는 점을 잘 보여줄 것이다. 이는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양질의 제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점수를 매길 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존스는 “다양한 모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심하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미국인의 기호를 조사해 전체 순위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스트 캐피털의 CEO 마틴 휘터커 Martin Whittaker는 비영리기구가 여러 사항들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만명의 미국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 결과가 9월 말 발표됐다. 그는 “거창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계획을 어젠다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투명성과 정보의 흐름만 향상시킬 수 있어도, 더 공정한 기업이 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매킨지 McKinsey의 북아메리카 컨설팅 부문 대표 게리 핀커스 Gary Pinkus는 저스트 캐피털 프로젝트에 참여하진 않지만, 올바르게 활용 한다면 저스트 1000 리스트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 리스트가 요즘 임원진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 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 또, 분기별 이익만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커스는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보다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 앞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란 책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도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존스는 미국을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돌려놓고자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우리가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동떨어진 곳이 되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정되고, 부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전쟁, 혁명, 그리고 더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