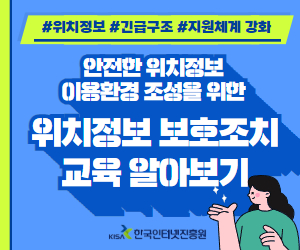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
1945년 1월30일 오후9시, 발트해. 소련 잠수함 S-13함이 독일 수송선 빌헬름 구스틀로프(Wilhelm Gustloff)를 향해 어뢰 세 발을 쏘았다. 피격 45분 만에 길이 208m에 2만5,484톤짜리 거대한 선체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배가 기울어 구명정을 내릴 틈도 없었다. 독일이 구축함과 소해정을 급파해 구조한 인원은 1,252명. 나머지 9,343명은 겨울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타이타닉호 침몰 희생자(1,513명)의 6배가 넘는 참사였음에도 이 사건은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정당한 군사행동이었기 때문. 함락 위기에 몰린 동프로이센(지금의 폴란드 지역)에서 탈출하려는 초대형 선박을 독일군에게 1,000만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당한 소련이 곱게 보내줄 리 없었다. 구스틀로프호도 노동자용 민간 유람선으로 건조됐으나 독일군 병력수송함, 병원선, 잠수함대 휴양시설로 사용된 군용 선박이었다. 참사가 잊혀졌던 두번째 이유는 독일의 입조심. 전범국가로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독일은 애써 참사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사고 당일은 독일인들이 열광하며 선택했던 히틀러의 집권 12주년 기념일이었다. 참사는 요즘 재조명되고 있다. '양철북'과 '넙치'의 작가로 1999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귄터 그라스가 소설 '게걸음으로 가다(2002년)'를 통해 생존자 후손들의 눈으로 본 독일사회의 갈등을 그려낸 뒤 '인류가 기억해야 할 억울한 희생'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귀국하는 조선인 4,000~1만2,000명을 몰살시키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의혹 속에서도 과거로 묻혀지고 있는 유키시마환 침몰사건(1945년 8월24일)과 대조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