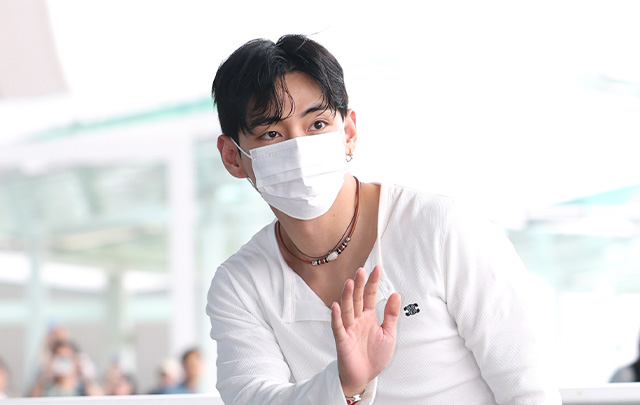식었던 분위기가 용광로처럼 타올랐다. 두산은 11일 잠실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4차전서 6회까지 2-7로 뒤졌다. 경기는 끝난 듯했다. 이틀 뒤 대구에서의 최종 5차전을 생각하는 편이 빠를 듯했다. 그런데 두산은 7회말에 5점을 냈다. 2사 후 연속 3안타로 1점을 따라가더니 2사 만루 볼카운트 2-0에서 대타 김현수가 2타점 우월 적시타를 때렸다. 5-7에서 양의지와 이원석의 연속 적시타까지 터져 기어이 7-7 동점을 만들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두산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7-7 동점 후 2사 2ㆍ3루에서 한 방이 더 나왔어야 했다. 두산은 7회 기적의 5득점으로 삼성을 홀릴 뻔했으나 이닝이 바뀐 직후 너무도 빨리 실점하며 되레 홀리고 말았다. 8회초에 들자마자 김창훈이 선두타자 이영욱을 볼넷으로 내보낸 게 화근이었다. 두산은 잠수함 고창성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고창성은 준플레이오프부터 전날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마운드에 올랐다. 체력이 바닥나 악으로 던져야 했다. 그런 고창성은 몸에 맞는 공과 희생번트를 허용해 1사 2ㆍ3루 위기를 만들어준 뒤 바통을 레스 왈론드에게 넘겼다. 경기 전 윤석환 투수코치의 만류에도 "오늘(11일)도 던지겠다"고 투혼을 불사른 '믿을맨' 왈론드였지만, 무실점을 기대하기엔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 결국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던 박한이에게 깊숙한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허용, 통한의 결승점을 뺏기고 말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