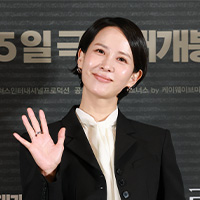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겐바(現場·현장)입니다.”
6월 일본 도쿄에서 만난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 담당 공무원은 “기술만 뛰어나면 농업 혁신이 알아서 이뤄질 것 같지만 실제 농업 현장은 이상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확 로봇을 도입하려던 일본의 한 아스파라거스 농장은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다. 수확 로봇 도입에 앞서 작물을 심은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물이 자란 높이가 불균형했고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통로는 로봇이 지나다니기에는 좁았다. 작물이 어떤 곳은 빼곡하게, 어떤 곳은 듬성듬성하게 자라 있어 로봇의 오류도 자주 발생했다. 결국 작물을 심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통로 간격을 넓히고, 농장을 규모화하는 생산 방식의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달 우리 농업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 현장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파마겟돈(농업(farm)+아마겟돈)이 온다’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농법 도입률이 일본과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16%로 상당히 높다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시설원예 농가 전체 면적인 5만 5000㏊를 기준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한 면적을 따져본 비율이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딸기 등을 키우는 시설원예는 상대적으로 스마트농법을 도입하기 쉽다. 여기에는 70대 이상 노인들이 허리를 구부려가며 재배하는 고추·상추 같은 노지 작물들은 모두 빠진 수치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만 봐도 전체 농가 97만 4000가구 가운데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수는 3만 1000가구로 3.2%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지 면적이 2㏊ 미만인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87%에 달한다. 영세 농가가 일일이 스마트농업 도입과 생산 환경 변화를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농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며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성을 쌓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걸핏하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16%라는 숫자 뒤에 숨어 ‘겐바’를 외면하면 스마트농업 혁신은 여전히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