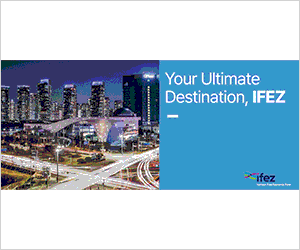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관 끝자락에는 고종 황제의 어진과 예검, 경운궁에 설치됐던 전화기 등 격변하던 대한제국 시절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증서도 함께 놓여 있다. 1897년에 작성된 대조선보험회사의 것으로 소가 죽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사회에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인데 사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험증서 자체보다 그 아래에 적힌 ‘사원들이 소 주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다는 핑계로 돈을 갈취하여 많은 원성을 샀다’는 부연설명 한 줄이다.
보험 영업사원들이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대가로 계약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뜻으로 120년이 지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시절 보험 계약자와 보험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상상해보면 그 같은 부당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의 구조와 보장,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일반 농민들의 이해도가 지극히 낮았을 테니 이를 악용한 영업사원이나 보험사의 횡포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과거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험시장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계약자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고 보험사들도 불신 극복 방안으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많이 줄었고 불신의 벽도 크게 낮아졌다.
대신 최근 보험 시장에는 계약자와 보험사 간 정보의 상호 안정적 흐름을 저해하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바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 상품 자체다. 언뜻 보면 만능 상품 같지만 복잡한 구조 탓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떨어지는 모양새다. 소비자의 낮은 이해도는 정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지 보험사에 대한 불신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품의 복잡성이 시대의 급변과 맞물리면서 보험사들조차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계약자도, 보험사도 사고파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형국이다.
복잡한 상품은 당장 마케팅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어렵게 끌어올린 소비자 신뢰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내포돼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예측이 어려운 상품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환경에서 보험사에 치명적이다. 보험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이다. 당장의 영업만 생각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