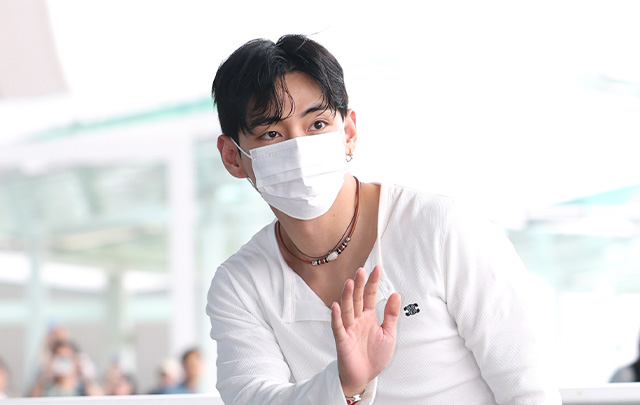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하다못해 빵 끈이나 빵 봉지에 붙이는 스티커까지 다 돈을 주고 사야 해요. 그것도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값에요. 명색이 ‘빵 프랜차이즈’인데 본사가 가맹점에 이런 물품을 팔거나 인테리어 비용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나요?”(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점주 B씨)
5일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보이지 않는 갑질과 영업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서울 중심지에서 편의점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점주 A(40대)씨는 “‘권장’이라는 이름으로 점주들이 알게 모르게 입는 피해가 크다”며 “베이커리나 튀김기계 등을 설치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돈이 안 돼서 철거할 때 철거비는 결국 점주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산대 뒤에 설치된 담배 광고판을 가리키며 “이것도 24시간 불을 켜놔야 해서 설치하기 싫었지만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달았다”며 “광고비를 본사와 가맹점이 6대4로 나눠 가진다는데 광고비가 총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편의점 3사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매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규 매장을 내려는 점주에게 주변의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떠안게 하는 경우도 여전하다”고 귀띔했다. A씨는 현재 폐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튀김기계 등 권유에 설치했지만 철거땐 나몰라라”
“소모품 외부보다 비싸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가”
본사 ‘보이지 않는 갑질’에 ‘영업난’ 겹쳐 이중고
서울 외곽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B(40대)씨는 오전7시부터 자정까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열었지만 아직도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다. 매출이 주변 가게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본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 B씨는 “매출의 65~70%가 본사에 납부하는 재료비”라며 “여기에 임대료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오른 인건비를 내고 나면 큰돈 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씨는 “가맹점 영업이 잘돼서 거기에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가맹 본사는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팔아 마진을 취한다”며 “빵 담는 바구니며 커피컵·빨대까지 안 파는 것이 없는데 가격이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주들에게 물건 파는 것에 매출을 의지하고 있다”며 “이런 물건들을 최소화하거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 만에 한 번씩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데 본사 부담은 20%뿐”이라며 “공사비를 7,000만~8,000만원만 잡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면서 “내년이면 인테리어 교체 시기가 돌아오는데 동네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햄버거집 등이 새로 들어서면서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윤선·변수연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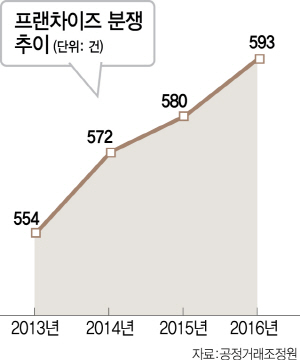
 sepys@sedaily.com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