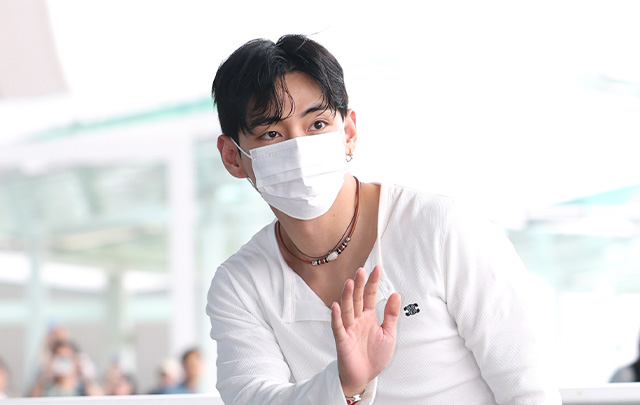차 소장은 그 예로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다양한 신성장 전략을 들었다.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유행처럼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은 미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집권기간의 먹거리였던 셈이죠.” 기업은 특성상 단기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라도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5만3,000개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20조원 가까이 되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각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너무 많은 R&D 사업이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체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소장은 특히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학생들만큼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가지 답만 가르치고 배운다는 점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르치다 보니 ‘상상’하는 법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융합 교육 역시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말만 융합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존 교육과 다를 게 없습니다.” A와 B가 융합하려면 가르치는 단계부터 학문이 융합돼야 하는데 각자 자신의 학문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전문가들의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너무 자기 것만 고집하며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보니 융합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 소장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앨빈 토플러의 경고처럼 한국 경제가 계속 팔로어(Follower)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