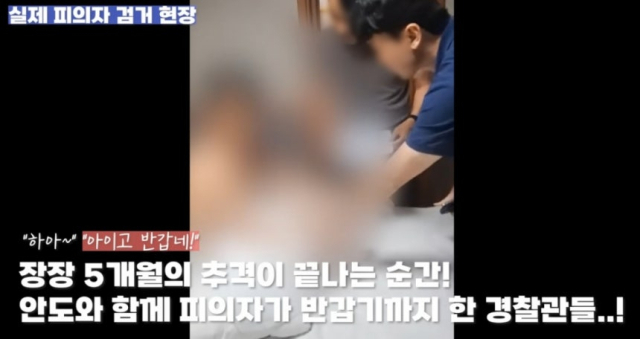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올해 한국의 경쟁력을 지난해와 같은 23위로 평가했다. 전체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세부 항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고질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중 ‘경제 성과’가 27위에서 18위로 뛰어 올라 간신히 1년 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경제 성과 분야가 크게 상승한 것은 세부 항목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위에서 7위로 올라서고 기업들이 수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국제 무역 항목이 8계단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 효율성’도 27위를 기록해 1계단이라도 올라갔다. 동학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들며 금융시장 순위가 34위에서 23위로 수직 상승하고 경영 활동 항목이 30위로 6계단이나 오른 덕분이다. 민간의 힘이 국가 경쟁력을 지탱해준 셈이다.
반면 민간의 활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 효율성’은 28위에서 34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 항목 중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미끄러진 것이 상당한 타격을 줬다. 정부는 조세수입이 늘어난 탓이라고 밝히지만 부동산 세제 등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있는 조세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업 환경을 뜻하는 기업 여건의 순위가 3계단 떨어지며 49위로 최하위권까지 내려앉은 것은 퇴행적인 정부 정책이 민간의 성장 여력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말로는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 ‘기업 규제 3법’ 등 온갖 족쇄로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궁리만 하니 이런 초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오죽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0개 기업 조사에서 규제 개혁 체감도가 3년 연속 떨어졌겠는가. 정부는 나라 곳간만 뒤져 쓰는 손쉬운 정책이 아니라 노동과 교육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산업 육성과 생산성 제고 없이 재정을 화수분처럼 쓰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