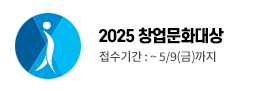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답은 ‘사람’과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상상력’에 있다.
지난달 26일, 농촌유토피아대학원 학생들과 경주 불국사 인근 진현동을 찾았다.
수학여행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세월의 격랑 속에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허로 방치되었다. 지역을 강타한 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 인구 감소의 삼중고 속에 문화와 역사마저 침묵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주민들과 문화 재생의 뜻을 함께하는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불리단길 형성’이라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현장을 수업으로 마주했다.
수업이 진행된 ‘주오일장’은 과거의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내 포차 공간이다. 평소에는 저녁에만 문을 여는 곳이,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의 강의장이 되었다. 지역의 유휴 공간이 ‘교육과 사유(思惟)’의 장소로 탈바꿈된 것이다.
이는 농촌유토피아를 실행하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장으로 ‘로마드대학원(nomad+campus)’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상상력을 창조하라’는 주제로 지역에 방치된 폐 공간을 살려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젬스톤 F&B(주) 이창렬 대표의 강의는 현장이 학문을 도전하게 하고, 이론이 실천으로 검증되었다. ‘도시에서 지역으로’라는 말이 물리적 이동이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이동임을 실감하게 했다
스페인 자치공동체 마리날레다를 이야기한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산다’에 “빵과 장미”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한 빵뿐 아니라, 존엄과 꿈을 위한 장미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오일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방치된 공간을 공동체의 가치와 지역 청년들의 소통을 담아낸 ‘장미’와 같은 공간이다. 농촌유토피아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조윤지씨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각자의 재능으로 전환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을 보며 많이 배웠다”며 “비록 지금은 일개 도시민이지만, 도시와 지역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대학원생 박수진씨는 “현장을 통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조용하지만 힘찬 움직임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현장 수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한 의지로 다져졌다.
농촌유토피아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닌, 현장을 교과서로 삼는 실천적 배움이다. 지역 사람들의 삶과 공간, 그리고 역사와 문화 유지를 통해 상상력을 창조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인 것이다.
진현동의 불리단길, 주오일장, 그리고 이곳을 찾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의 희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공간 활용의 기술을 넘어 가능성에의 도전과 사람을 품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변화다.
지역은 누군가의 삶터이며, 기억의 저장소다. 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식과 역사, 공동체의 가치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농촌유토피아는 농촌을 살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유토피아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진 곳, 그곳이 도시든 농촌이든, 삶이 숨 쉬는 곳이 바로 유토피아다. ‘리쇼어링’의 열쇠는 정책 이전에 사람이고, 공간이며, 상상력이다. 지역이 살아나는 현장에 농촌유토피아는 강한 생명의 꽃을 피울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