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한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이 무단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완료’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삭제된 줄만 알았던 영상은 3년 뒤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캡처본을 포함해 5건 이상의 동일 피해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조치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삭제 조치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재유포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반복적 삭제 조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했지만 영상이 계속 유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영상을 한 번에 완전히 삭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간이 지나도 영상이 다시 퍼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다”고 호소한다.
영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영상 삭제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URL·파일원본·키워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쳐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 삭제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영상물에 의한 금전 갈취 사례의 경우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과 달리 몸캠피싱이나 주식리딩방사기·코인사기 등을 지급정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B씨는 지난달 몸캠피싱 협박에 수백만 원을 갈취당했다. 그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뒤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는 “급히 경찰서를 방문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이미 가해자가 피해액을 인출하고 빠져나간 뒤였다”고 전했다. 은행 측으로부터는 ‘몸캠피싱 범죄 가해 계좌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이 뒤늦게 돌아왔다.
디지털 범죄 대응 업계 한 관계자는 “단발성 조치만으로는 범죄 발생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최신 솔루션을 공공기관이 적극 도입해 고리를 잘라내고, 동시에 가해자 수익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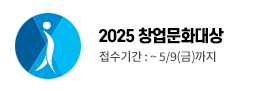







 brassgun@sedaily.com
brassg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