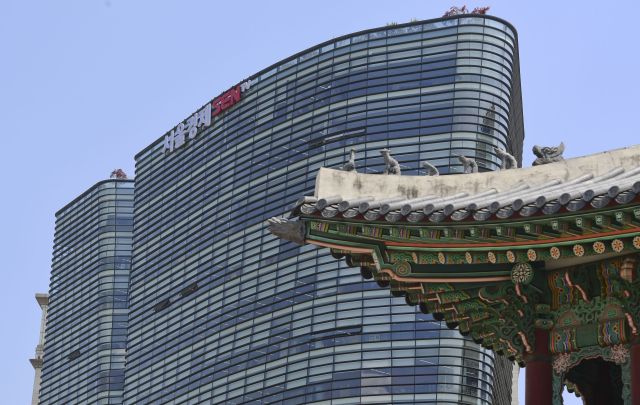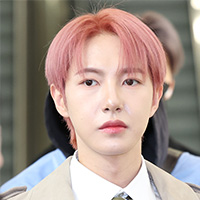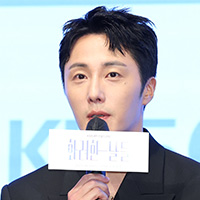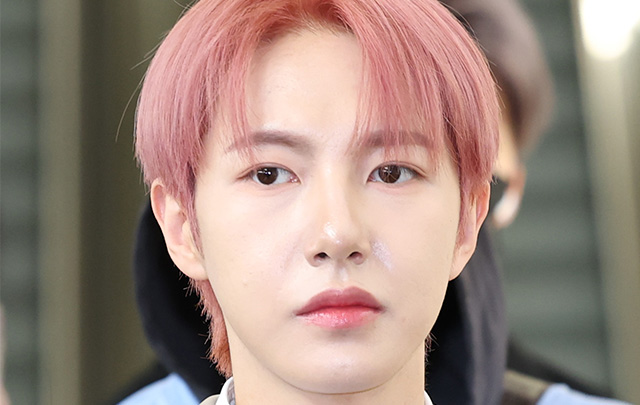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이자 정치적 내전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고 국무총리는 스스로 물러났으며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분풀이식 탄핵으로 떠밀리듯이 사퇴했다.
탄핵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떠나 경제부총리의 부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경제 사령탑이 공석이라고 해서 당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핵심 3축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는 대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한미 통상 협의를 진두지휘하는 결정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안은 그만큼 깊어진다.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먼저 무너지고 있다.
사실 최근 한국 사회의 위기는 정치의 실패다. 일련의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과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그 자리를 불안으로 채울 것이고, 국민은 그 자리를 불신으로 메울 것이다.
이미 한국은 정치·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분열과 대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넘어갈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며 눈에 띄게 역동성을 잃어갔다. 특히 2023년에는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역전당한 데 이어 올해 일본에 또다시 2년 만에 역전될 위기에 처해 있다. 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가장 성공적인 모범 국가로 부상했던 한국이 피크아웃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중·러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 러·우 전쟁, 북핵 고도화 등 지난 10여 년간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았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복합 위기를 풀어나갈 정치적 공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이 멈춘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다시 정치의 책임이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prize_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