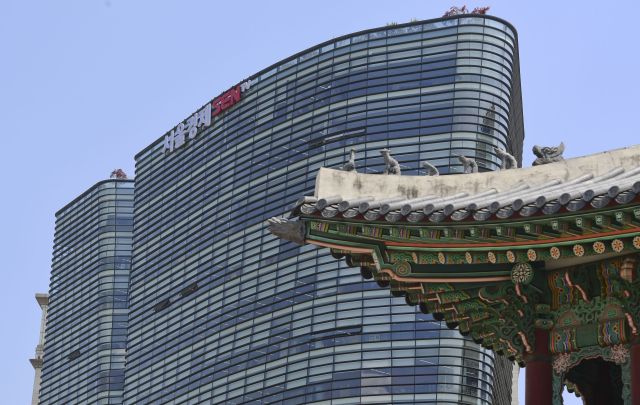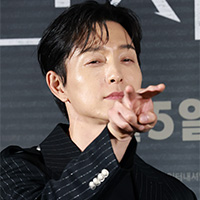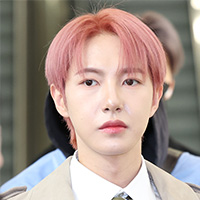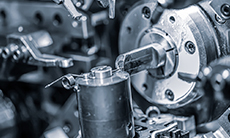최근 만난 전직 검사들은 현재 검찰이 가장 시급히 집중해야 할 분야로 한목소리로 ‘기업 수사’를 꼽았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공정거래와 제도의 허점을 노린 탈법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강점이 드러나는 분야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기 미제 사건 몇 건을 더 해결한다고 해서 이미 추락한 검찰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과 시장에서 벌어지는 위법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관심과 자원은 정치적 사건에 온통 집중돼 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올해 초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형사부로 대거 이동시켰다. 민생 범죄 대응과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였지만 정작 기업 수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서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검찰의 역량이 정치적 사건에 몰릴수록 기업 수사의 우선순위는 자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해 “한참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전직 특수통 검사들이 꽤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기업 수사 경험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해 현장 전문성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평가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는 쉽게 사라지지만 다시 복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 수사는 단지 경제 범죄를 단속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경쟁 원칙을 지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최근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주한미군 하도급 입찰 담합 사건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이번 사건 수사는 불공정한 시장 행위를 바로잡는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한미 간 민감한 외교 현안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업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늑장 고발을 반복하면서 검찰이 수사의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일수록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이제 정치적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검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e@sedaily.com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