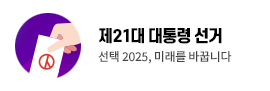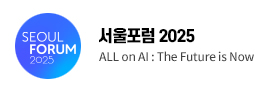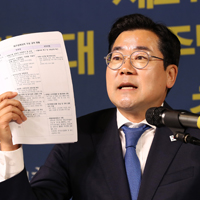“왜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늘 품어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저출생은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소득 불평등, 보육 환경 부족,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는 난제 중 난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혼·출산·육아 자체를 꺼리는 사회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가 2024년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임신·출산·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이 10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줄었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듯 막연한 두려움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유럽처럼 양육 비용이 낮아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으로 바꿔나가는 일, “왜 아이를 낳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풍토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 문화를 바꿔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문화 전환에 힘쓰고 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광고 캠페인을 펼치며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알리고, 주요 방송사와 협업해 결혼과 육아의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확산하며 자연스러운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됐다. 경제계·방송계·종교계·학계 등이 함께 ‘저출생극복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캠페인을 전개하며 문화적 전환에 힘을 보탰다. 주요 방송에서는 과거에 보기 힘들던 다자녀 가족이 등장하고, 혼자 살지만 조카를 보며 결혼을 꿈꾸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했다. 스며들 듯 전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2024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결혼 긍정 인식과 자녀 필요도, 출산 의향이 모두 증가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1.8명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와 인식이 달라지면 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이런 노력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체감한 나라들은 우리의 문화 전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노력이 글로벌 저출생 해법의 단초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문화 전환은 그 신뢰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자라날 때, 우리는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당당히 내놓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그 첫걸음은 문화에서 시작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