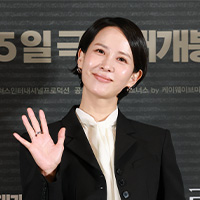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실이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국지적인 극심한 가뭄은 우리의 물관리 시스템이 극한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공간’이 돼 홍수와 가뭄에 동시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물순환촉진법’이다. 이 법은 단순한 방재를 넘어 도시를 자연과 공생하는 생명체로 재설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순환촉진법은 도시화로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 먹는 물 안전에서 생태계 보전, 재해 예방에 이르기까지 물관리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핵심은 ‘물순환촉진구역’ 지정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다. 물순환이 심각하게 저해된 지역을 과학적 평가를 통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단순 배수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빗물을 가두고, 스며들게 하고, 재이용하는 자연 순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도시 물 문제의 핵심은 ‘불투수 면적’이다. 도시의 80% 이상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홍수뿐 아니라 지하수 고갈, 열섬 현상 악화, 미세먼지 증가 등의 재해로 이어진다. 촉진구역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다. 불투수성 포장을 1등급의 투수성 포장으로 전환하고, 빗물 저류조·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원과 녹지를 빗물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재편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하수관 확장보다 지능적인 해결책이다.
물순환 회복 사업은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가져온다. 지하 수위 안정으로 싱크홀 위험을 줄이고, 증발산 냉각 효과로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녹지 증가를 통해 미세먼지와 소음도 줄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탄소 중립에의 기여다. 건강한 흙과 녹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한다. 특히 광물탄산화 과정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암석과 반응해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양은 상당하다. 물순환 회복은 단순한 물관리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순환촉진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지도’ 작성이 시급하다. 지역별로 물의 이동 경로와 저장량·증발량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자체의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와 기술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나아가 가정에서의 빗물 이용, 불투수 포장 제거 등 주민의 인식 전환과 참여도 중요하다.
기후 재난 시대에 홍수와 가뭄은 관리해야 할 일상이 됐다.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되살리는 지혜로운 투자다. 물순환촉진법은 우리에게 단순한 법조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아스팔트에 갇힌 도시에 물소리를 되찾고 땅이 숨 쉬게 하며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속 가능한 물 환경을 만드는 일. 이제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