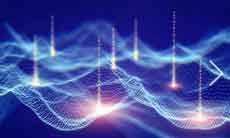올해 쌀 생산량이 약 354만 톤으로 집계돼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깨씨무늬병과 9월에 지속된 잦은 비로 인해 정부의 예상 생산량보다 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 면적(확정) 및 농작물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 9000톤으로 1년 전(358만 5000톤)보다 1.3%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2022년 3.0%, 2023년 1.6%, 2024년 3.2%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2020년 350만 7000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다.
쌀 최종 생산량인 354만 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상 생산량(357만 톤)보다 3만 5000톤(1%) 적은 수치다. 농식품부는 “깨씨무늬병과 9월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25년 예상 초과생산량 16만 5000톤 가운데 10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최종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올해 쌀 초과생산량도 일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발표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밀하게 재전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향도 크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67만 8000ha로 전년(69만 8000ha) 대비 2만 ha(2.9%) 감소했다.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는 최소치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올해 8만 ha 감축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생산량 감소가 소비량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실제 감축 면적은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향상됐다. 10a(아르)당 생산량은 522㎏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충남(69만 4000톤), 전남(68만 7000톤), 전북(54만 3000톤)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최근 쌀값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5일 20㎏에 6만 1988원을 기록했던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5만 6954원까지 하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