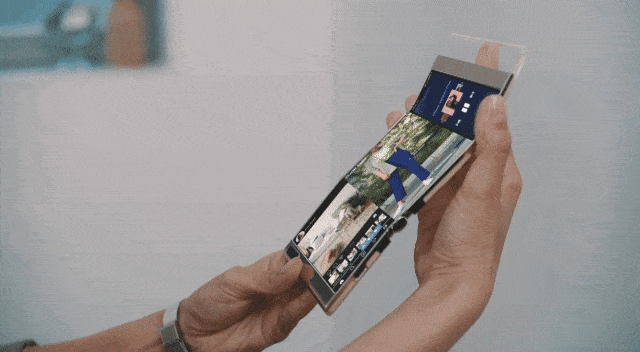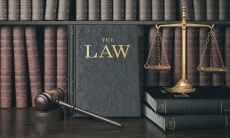그러나 위성궤도와 그에 따른 주파수 자원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기존 통신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저궤도 보다 훨씬 아래인 지상 20~30km 상공의 성층권에다 그것도 위성이 아닌 무인 비행선을 띄워 올려 중계기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성층권통신시스템(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이 주목받고 있다.
HAPS란
HAPS는 대류권과 중간권 사이의 성층권에 통신 탑재체를 싣고 있는 비행선을 인구 밀집지역과 같이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상의 일정 위치에 체류시켜 각종 무선통신 서비스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성층권은 우선 정지궤도나 저궤도에 비해 지상에서 훨씬 가깝다. 또 성층권은 기상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항공권 관제 영역 위쪽에 있어 비행기 등이 다니지 않는다. 여기에다 값비싼 위성이 아니라 비행선을 띄워 통신과 방송용 중계기로 사용하려는 것이 HAPS다.
현재 각국이 시험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따르면 비행선의 크기는 약 150~250m에 달한다. 축구경기장 만한 크기다. 내부에는 헬륨가스를 채워 부력을 얻는다. 과거 수소가스를 사용한 비행선이 폭발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헬륨은 폭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행선은 또 전동기로 구동되는 프로펠러를 달아 위치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필요한 전력은 낮에는 비행선 표면에 장착한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밤에는 내부에 장착된 연료전지를 이용한다. 이 같은 비행선에 무게는 약 1t 정도의 통신·방송시스템을 매다는 것이다.
비행선 1대로도 한반도가 서비스 범위
이처럼 성층권에다 비행선을 띄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광역성, 망 구성의 유연성, 광대역성 등 위성통신의 장점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거기에다 위성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시스템 비용이 4분의 1내지 10분의 1에 불과하다. 2~3년 마다 비행선을 착륙시켜 헬륨가스만 보충하면 된다. 이때 비행선의 손질은 물론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성의 수명이 5~7년이지만 비행선은 재질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위성에 비해 쉽게 비행선을 띄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서비스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 위성에 비해 효율성은 훨씬 뛰어나다.
HAPS는 기술적으로도 위성에 비해 전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전송손실이 300만분의 1로 줄어든다. 저궤도 위성과 비교해도 1600분의 1로 감소된다. 그만큼 단말기를 소형화 할 수 있고 저전력 휴대통신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전송지연 시간도 짧아진다. 정지궤도 위성 통신에서는 쌍방향 통신시에 지연시간(240~270ms:1ms는 1천분의 1초)이 문제가 되지만 HAPS은 지연시간이 불과 0.3ms다. 또 CDMA과 접목할 경우 1대의 비행선으로 직경 1000km의 광범위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셀플래닝(Cell Planning)을 통해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함으로써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현재의 이동통신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물론 산간이나 해상 등과 같은 서비스 미제공지역도 거의 사라진다.
특히 재해 발생으로 지상 이동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백업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 방송에 활용될 때도 기존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 시스템에 비해 빌딩 등과 같은 지상구조물에 의한 반사(Ghost)의 영향이 적은 고화질의 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APS는 고정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서비스, 관측·탐사·감시·위치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에는 통신이 방송용으로 이용하다 비상시에는 특정지역으로 비행선을 이동시켜 관측·탐사·측위 등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은 서비스라는 점이 걸림돌. 실제로 각국은 개발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면이 있다.
선진국들 앞다투어 HAPS개발 경쟁
미국 SSI사는 세계 최초로 성층권통신시스템인 STS(Stratospheric Telecommunication Service)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험용 4기를 생산하고 2005년부터 상용 서비스에 나선다는 목표다. 그러나 최근 2007년까지로 연기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SSI는 고도 21km에 길이 약 208m의 비행선을 체공시켜 47/48GHz 대역 및 2GHz IMT-2000 대역을 사용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는데 비행선 1기당 약 400만명의 가입자를 예상하고 있다. SSI사 측에는 이태리 Alenia, 프랑스 톰슨, 미국 스탠포드 텔레콤, 록히드 마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우정성과 과학기술청을 중심으로 지난 96년부터 조사연구를 해와 97년 개념설계를 마치고 98년부터 본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99년에는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성층권 플랫폼 개발이 결정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도 미국 SSI처럼 오는 2005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Sky-Net이라 명명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광대역 성층권 통신시스템 구축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비행선은 전장 약 245m, 총 무게는 32.4t에 이른다.
일본 우정성은 지난해 말 하와이에서 패스파인더(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지상 20km 상공에서 IMT-2000, HDTV 등 통신과 방송에 대한 시험을 성공했다. 특히 일본은 통신과 방송 외에도 관측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즉 특정지역에 대한 연속적인 관측을 함으로써 농림어업, 교통, 운수 등 산업측면에서 응용하는 방안, 재해발생시 대책 마련에 기여하는 방안, 육상·해양·성층권의 대기를 관측함으로써 지구 환경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도 지난 95년 6월 ESA(European Space Agency) 내부에서 정식으로 HALE(High Altitude Long Endurance)라 명명된 성층권 통신시스템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HAPS개발이 본격화 됐다.
ESA는 지상 약 21km 고도에 비행선을 띄워 비행선단 서비스 영역이 반경 약 643.5km이고 5~10년의 비행선 수명을 예상하고 있다. 비행선 통신의 처리용량은 한 개 당 10만 회선으로 설계해 2개의 비행선만으로 영국 전역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성층권 비행선에 의한 전파통신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정보통신부 국책과제로 지정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했다. 이어 99년부터 2001년까지 ETRI와 항우연이 공동으로 시스템 기반기술 연구를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국책과제로 ‘다목적 성층권 비행선 개발’을 지난 2000년 12월에 시작해 2007년 8월까지를 목표로 고도 20km 성층권에서 1개월 이상 체공이 가능하며 차세대 통신중계 및 원격탐사용으로 활용할 200m급 비행선을 개발중에 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달 중으로 중에 전남 고흥에서 지상 3km 높이에 50m 크기의 비행선을 띄우는 시험을 할 계획이다.
백재현 아이뉴스24 산업부차장 brian@inews24.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