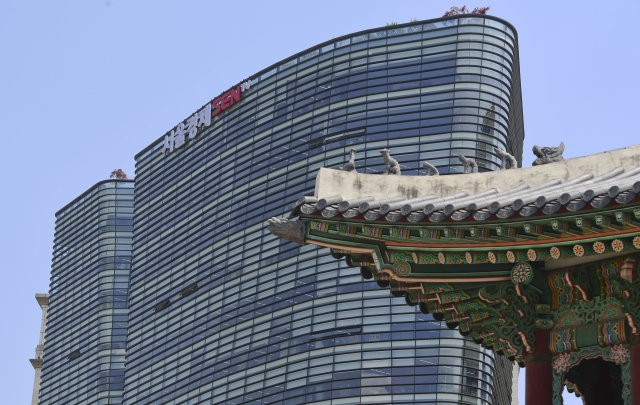포춘 100대 기업은 사외이사 중 74%가 업계에서 일한 전문가 집단으로 재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쟁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영입한 기업도 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법조와 국세청·공정위·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한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피아 출신 중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56%에 달할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장 어느 곳에서도 먹혀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직 기관장과 감사의 30% 이상이 관피아일 정도로 공공 분야도 겉돌고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규제다.
기업들이 왜 '바람막이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끌어들이려 하고 협회장으로 오기를 바라겠는가. 틈만 나면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기업 때리기가 횡행하고 이런저런 규제로 기업활동을 옥죄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이 퇴직 관료들이 기업에 똬리를 틀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다.
현직일 때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물러나서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들어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여전히 수두룩하다. 관치와 규제의 생태계가 관피아 번성의 뿌리인 셈이다. 규제혁파가 이뤄지지 않는 한 관피아 척결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