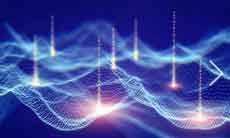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
지난 2005년 국내 은행의 순익은 13조6,000억원이었다. 2007년에는 사상 최대인 15조원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권은 6조2,000억원을 버는 데 그쳤다. 순익이 반토막 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의 보신주의 탓"이라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당국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을 보호한다며 추진한 금리·수수료 인하 같은 가격 개입이 직격탄이었다. 금융회사들은 사소한 상품까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이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했다.
시장금리는 낮은데 손발은 묶어둔 채 뛰라고 한 결과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금융사는 돈을 못 벌어 일자리를 못 만들고 세금도 못 낸다. 줄어든 세수는 국민이 채우고 있다.
'착한 정책'이 가져온 역설적 함정이자, 심하게 표현하면 정책적 비극이다.
'착한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배당정책, 대출 최고금리 인하 같은 '착한 정책'은 큰 틀에서 방향은 맞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의도가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업을 내수진작의 수단으로 줄지어 이용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확대 등에 이어 최근 다시 내놓은 임금인상 정책도 이런 줄기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0일 "선한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대표적이다. 2011년 "불합리한 관행을 없앤다"고 시작한 당국의 금리·수수료 개입은 시작은 좋았다. 하지만 정치 바람을 타며 지나치게 확산됐다. 곧이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낮췄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출금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당국이 조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 탕감을 해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서민금융지원도 확대됐다. 창조경제를 한다며 은행에 대출사업도 지시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았다. 이자부담이 줄고 수수료를 안 내도 됐다. 1~2년이 지나자 상황이 돌변했다. '은행 수익 감소→법인세 납부액 급감→근로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 탓이다.
2005년과 비교해 사라진 은행권의 순익 6조원을 단순계산해도 약 1조3,000억원의 세금이 줄었다. '연말정산 대란'을 일으킨 정부가 최종적으로 더 얻은 세수가 5,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금융사의 팔을 비튼 대가는 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자와 만나 "(정부가) 은행에 돈을 못 벌게 하면서 국가세입이 수조원이나 없어졌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착한 정책'의 폐해다. 두 사업 모두 취지는 좋다.
다만 현실은 달랐다. 돈이 없다. 지난해부터 무상복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중앙정부는 수차례 충돌했다. 경상남도는 결국 이달 9일 지원중단을 선언했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당장 광주 지역에서는 만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 게다가 무상복지 예산이 늘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 금액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족한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 예비비로 5,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당확대 정책도 '착한 정책'의 역설이다.
지난해 정부는 내수를 살린다며 기업들에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배당소득세제도 도입했다. 기업이 여윳돈을 쌓아놓고 있기보다 배당을 늘리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는 달랐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적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배당을 늘려도 의료와 카지노·관광은 해외에서 한다.
특히 배당확대는 외국인의 배만 불렸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각각 51.4%, 44.2%다. 배당을 확대해봐야 상당 금액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금융사들은 더하다.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 비중은 66.8%이고 KB금융은 69.2%에 달한다.
최고금리 인하 문제도 그렇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서민이 적은 부담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낮출 때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도와 방향이 옳은 정책이라도 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은 287만1,700원인 반면 사업소득은 86만2,200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버는 탓이 크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이다. 이를 한달 임금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가족을 쓰거나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
게다가 임금이 오르더라도 국내 소비와 직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해외직구와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관료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호텔이나 관광·의료 같은 실질적 규제를 없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