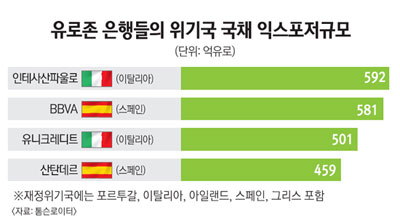|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이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유럽 은행권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연일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유럽은행청(EBA)이 역내 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공개해 은행 건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 번 무너진 신용과 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은행권이 직면한 3대 취약점을 제시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유럽 은행권의 위기상황을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유럽 은행권은 만성적 자금조달난에 시달리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초단기 대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유럽 은행들이 ECB의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창구에서 빌린 자금은 30억유로에 이르렀다. 이는 전주의 13억유로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대출 명목으로 ECB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ECB의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는 오히려 은행들의 자금난만 가중시킬 뿐 '언 발에 오줌누기'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을 낼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유럽 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재정위기국의 국채 익스포저를 줄이는 대신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은행으로 평가 받아온 오스트리아의 에르스테은행마저 11일 CDS 파생상품에 대거 투자했다가 지난 3ㆍ4분기까지 10억유로의 손실을 입었다는 충격적 소식을 발표하면서 돈벌이 창구가 말라붙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될 경우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액이 2,0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자본 확충에 개별 정부가 나설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활용할지를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유럽 은행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은행권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 당국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EBA가 마련한 은행자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FT에 따르면 EBA 감독위원회 이사회는 역내 은행들에 대해 핵심 기본자본비율(core tier 1)을 최대 9%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바젤Ⅲ가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7%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으로 모건스탠리는 유럽 은행들이 추가로 총 2,750억유로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BA는 또 7월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가 부실평가 논란에 휩싸이자 이번에 추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핵심 기본자본비율을 7%로 설정하고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 손실분까지 반영해 추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91개 은행 가운데 48개 은행이 불합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7월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고작 8개 은행만 불합격 처분을 받아 부실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은행권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의 시몬 사무엘 애널리스트는 "유럽 은행권이 수익성 악화와 자금 경색 등 만성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EBA는 위기론이 불거졌던 지난해 더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리스크를 차단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