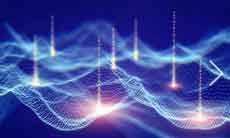가습기살균제·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미세먼지 사태가 계속 악화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1994년 부처가 발족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연일 설명·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야권·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에만 가습기살균제·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현안 보도에 대한 38건의 설명·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22일 동안 언론의 비판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자료를 하루 평균 1.72개 뿌린 셈이다. 16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안을 풀어가야 하는데 현재 환경부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다”며 “언론보도가 나오면 대응하는 식으로 사안에 접근하다 보니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가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 사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소극 대응, 폭스바겐과 닛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관련 잡음, 미세먼지 근본 대책의 부재 등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터진 2011년에는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발을 뺐고, 2012년 관련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에도 소극 대응을 일관했다. 피해 인정 범위는 폐 질환으로 한정 지었고, 지원도 장례비와 의료비로 제한했다. 피해자 신고 접수도 지난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4차 신고 접수를 시작했고, 뒤늦게 피해 인정 범위는 폐 이외 질환으로, 지원은 생활비 등으로 확대·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으로는 닛산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근본대책은 다른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이 주요 현안은 직접 나서 브리핑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직원들도 민감한 질문에는 입을 닫고 있다. 회의 등을 이유로 전화를 안 받는 공무원을 기자가 항의 방문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환경부는 최근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부서에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한편 윤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들의 윤 장관 퇴진 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내에서도 윤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환경부의 소극대응과 수장이 자기 목소리를 제때 못 낸 점 등이 일을 키웠다”이라며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