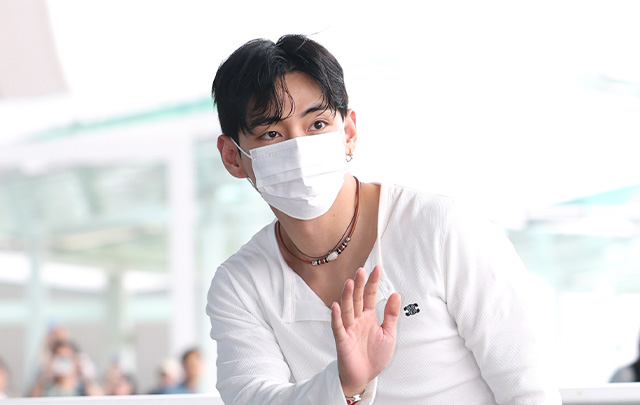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조세프 퓰리처(1847~1911). 그의 이름 앞엔 ‘신문 왕’, ‘근대 언론의 산파’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19세기 미국에서 언론의 황금기를 이끈 퓰리처는 그의 신문사 ‘월드’를 통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거대 기업과 정치인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훗날 그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권위의 보도·문학·음악상이 제정됐고, 언론대학도 세워졌다. 학교 벽에는 그가 생전 남긴 이 말이 새겨졌다. “냉소적이고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된 선동적인 언론은 그 천박한 수준에 걸맞은 천박한 국민을 양산할 뿐이다.”
#1899년 7월, 미국 뉴욕의 신문팔이 소년들이 거대 신문사의 횡포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 ‘뉴스 보이’라 불렸던 이들은 자기 돈으로 신문을 산 뒤 되팔아 작은 이익을 남기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어느 날 거대 신문사가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년들에게 판매하는 신문값만 올려 이익을 꾀했고, 뉴스 보이들은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다윗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백기를 든 골리앗은 바로 미국 양대 신문사인 월드와 저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월드의 사장은 조세프 퓰리처였다.
퓰리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근대 언론의 산파라는 추앙과 황색저널리즘의 창시자라는 오명. 신간 ‘퓰리처’는 부제 ‘권력의 감시자는 왜 눈먼 왕이 되었는가’가 암시하듯 언론인이자 사업가로서 퓰리처의 삶을 흑과 백 양면 모두에서 조명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책은 ‘권력의 감시자’로서 패기 넘치던 퓰리처의 청년기와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눈먼 왕’으로서의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다. 헝가리 출신 이방인이었던 퓰리처는 스무 살 때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독일어 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내디뎠다. 집요한 취재로 이름을 날린 그는 세인트루이스 지역 신문을 인수하며 언론사 경영을 시작하고, 서른 여섯 살에 미국 언론의 메인 스트림인 뉴욕에 입성한다. 그는 1883년 망하기 직전의 ‘뉴욕월드’를 인수해 자신만의 색을 입힌 신문사 ‘월드’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늘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오늘 월드 기사 봤어?’라고 물을 정도로 흥미로운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집요하게 파고들며 잔소리를 늘어놓던 그를 한 편집자는 이렇게 기억한다. “새벽 1시의 퓰리처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남자 가운데 세계 최고의 남자였다.” 퓰리처의 노력으로 월드는 대통령 선거, 주지사 선거, 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인에겐 감옥 신세를 지게 하고 공공 의제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렇게 월드도, 퓰리처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권력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책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퓰리처 월드’를 보여준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뉴욕 저널’의 등장이다. 신문사가 늘어나며 독자를 사로잡을 자극적인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졌고, 그 앞엔 퓰리처의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저널이 서 있었다. 기사 날조도 서슴지 않는 진흙탕 경쟁 속에 두 사람은 언론 선정주의, 즉 황색저널리즘의 대명사가 되었다. 일각에서 ‘퓰리처가 컬럼비아대학교에 기부금을 내 언론대학을 설립하고, 퓰리처상을 제정하려 구상한 것 자체가 이 오명을 씻어내긴 위한 수작’이라는 눈총을 보내는 이유다.
말년에 시력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온갖 통증에 괴로워한 퓰리처. 그는 죽기 몇 달 전 한 논설위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신께서는 월드를 위해 내 눈을 가져가신 것이 틀림없네. 이제 나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은둔자가 되었으니 말이지. 나는 눈먼 정의의 여신처럼 냉담하고,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네. 친구도 하나 없어. 그러니 월드는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이지 않겠나.”
저자는 퓰리처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그저 그의 생애를 따라가며 독자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언론·기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여지를 남겨준다. 파나마 운하 횡령 사건,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남북전쟁, 미국-에스파냐 전쟁,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법적 분쟁 등 한 개인을 넘어 19세기 언론 역사에서 굵직했던 사건들도 심도 있게 묘사돼 있다. 4만 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