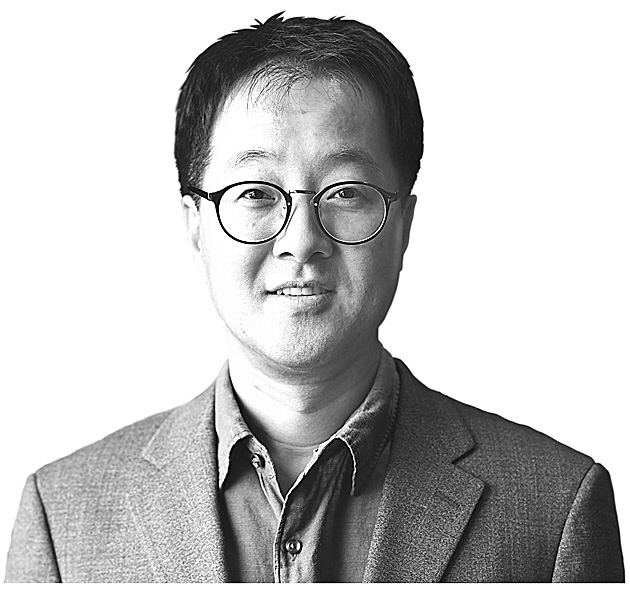“대다수 골프장의 정직원 수가 30~40명 정도입니다. 수십 명의 캐디를 정직원 형태로 고용한다면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골프장은 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된 지난 22일 경기도 A 골프장 관계자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랫동안 법적 지위로 논란이 돼왔던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이 법의 시행이 캐디 정직원화의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노동조합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이중적인 신분이다. 근무 시간이나 형태가 독특하다. 임금(캐디피)을 회사(골프장)가 아닌 이용자(골퍼)에게서 받는다. 동시에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기도 한다.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이 같은 직종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캐디의 이중적 지위를 보여줬다. 한 골프장의 캐디에 대한 계약 해지가 발단이 됐다. 부당해고로 봐 구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직원이 아닌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적 위치로 해석한 것이다.
당사자인 캐디들의 생각은 둘로 나뉜다. 상당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 더 편하고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B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C씨는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고 수입도 다른 정규직 종사자와 차이가 크지 않아 불만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당한 대우나 안전사고 발생 등을 생각해 적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 업계는 캐디의 정직원 수용이 되레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리 보호도 좋지만 비용 상승으로 골프장 경영이 더 악화하면 캐디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논리다. 또 이미 각자 코스 환경에 맞는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의 일반적인 교육보다 실효성이 더 크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캐디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직종별 현실을 간과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지금은 전에 없던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묘안 찾기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