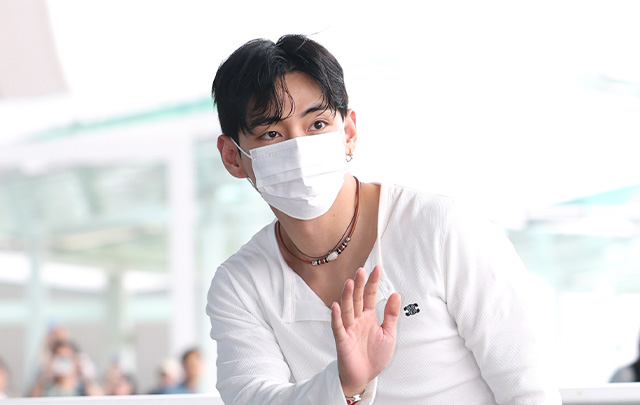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예산 삭감의 방향은 맞지만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일괄적으로 깎으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1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사이언스콩그레스 센터에서 만난 김복철(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과를 높여야 하겠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특정 카르텔처럼 비춰지는 지금의 상황은 아쉬울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효율 개선에 나서면서 내년도 연구 예산을 삭감했다. 주요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합친 출연금 기준 10.8%, 연구비에 해당하는 주요사업비만 보면 기관 대부분 20%대 줄었다.
김 이사장은 출연연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과제가 2배 이상 늘어나며 특정 R&D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배분에 고민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했다.
문제는 출연연의 비효율 개선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출연연의 근본적인 문제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을 꼽았다. 1996년 도입된 PBS는 R&D 과제 배정 시 연구자나 연구 기관이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체계다. 그는 “PBS로 큰 연구들이 각각의 과제로 파편화되다보니 연구자들이 장기 관점에서 연구를 책임지기보다 일부 과제 한 두 개만 맡아서 적당히 기준에 맞는 성과만 내는 문화가 형성됐다”며 “과제가 잘게 쪼개지다보니 나오는 결과물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지적한 연구비 나눠먹기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 예산 낭비 문제도 PBS 개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PBS에는 과제당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나 직접비 등의 비중이 정해져 있다.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거둬들이려면 과제 하나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그럴수록 직접비가 남아 당장 활용성이 적은 연구 장비를 구입하는 등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은 PBS”라며 “과제 당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에는 손대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배분 과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혁신 방향을 잡아갔다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카르텔 집단처럼 비춰지면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000년대 초 독일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 독일이 선택한 길은 ‘범부처 통합 전략’ 수립이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독일 정부는 4년 동안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구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이를 토대로 만든 정책 방향이 연구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더 많은 자유(igniting ideas, more freedom for new ideas)’”라며 “우리는 PBS 등 연구 개혁 논의를 20년 넘게 반복하고 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뮌헨(독일)=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취재단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