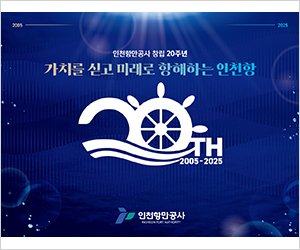첨단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갈수록 복잡·정교해지는 가운데 이를 다루는 경제분석 전담 조직이 과 단위에 불과하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국 단위 경제분석 조직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직과 위상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인원 보강과 조직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공정위 내부 조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경제분석과는 정원 8명 중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원이 7명에 불과하다. 근무 인원은 김상현 경제분석과장 1명과 5급 사무관이 5명, 7급 조사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이 직접 경제분석 업무를 하기보다 승인하는 결정권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근무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건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인원이 매우 부족해 한 명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분석과를 국 단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분석 등 복잡한 정량적 분석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석 역량이 곧 플랫폼 시장 규제의 핵심인데 지금 인력 수준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제재처럼 경제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사건 처리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분석, 정량 데이터 분석이 법리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증거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경제분석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체계적이고 대규모 경제분석 조직을 운용 중이다.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의 경제분석 인력은 26명에 달하고,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경제분석국(Economic Analysis Directorate)이라는 국 단위 조직을 따로 두고 약 80명의 경제학자를 배치해 사건 분석을 전담하고 있다. 독일 경쟁당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독일은 경제분석부서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학술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급 경제학자 40여 명을 고용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 가격 담합, 수직계약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 구성돼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경제국(BE)를 별도로 두고 70명 이상의 분석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의 경제학자이며 사건별로 경제학자 2명과 변호사 1명이 한 팀을 구성해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사건 하나에 대해 3인 분석팀을 구성해 대응하지만 우리는 1명의 사무관이 여러 사건을 동시 처리하는 구조”라며 “객관성 확보와 권위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긴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타기관 연구용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선 이 같은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조직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거란 회의론도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승인과 예산 확보, 내부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담국 신설은 공정위 내부의 의지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분석과 조직 격상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prize_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