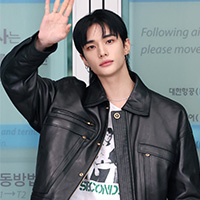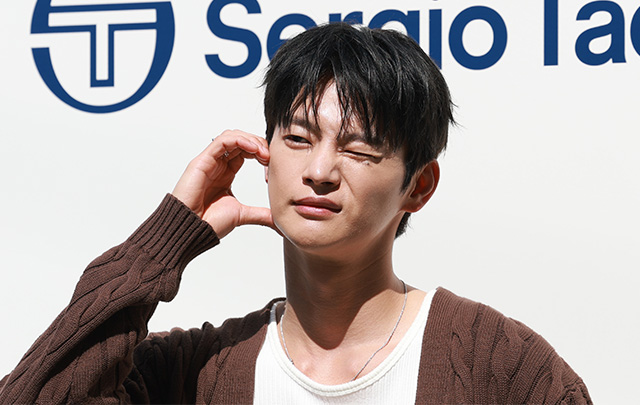이달 말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105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분기 만에 100조 원을 넘겼다. 기업들이 앞으로 갚아야 하는 회사채 잔액도 4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9월 26일 발행된 회사채는 105조 3296억 원으로 세 분기 만에 100조 원을 돌파했다. 3분기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2022년 66조 원, 2023년 77조 원, 2024년 89조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다. 기업들이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는 약 44조 원으로, 통상 기업들이 만기 도래 이전 차환 목적의 채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발행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회사채 잔액은 420조 62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회사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순발행액은 28조 1028억 원으로 2019년(28조 2601억 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조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새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가 일반 공모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투자 아닌 운영·차환용 조달이 다수
신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신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 목적이 아닌 운영 자금 확보가 목적으로 풀이된다. 경기 불확실성 속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석유화학 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늘어나는 시장성 차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105조 32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조 1023억)과 비교해 18.2%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3분기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순발행액도 크게 증가해 28조 102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0조 5973억 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로 기업들이 기존 차입금을 차환하거나 신규 채권을 발행해 차입 규모를 꾸준히 늘리는 모습이다. 26일 기준 회사채 발행 잔액은 420조 6246억 원에 달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규 조달 회사채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신규 투자에 사용된다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지만, 단순 차입금 차환이나 운영자금 목적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신규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 자금의 사용 목적은 크게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영업양수 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채무상환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규 투자와 관련이 있다. 상당수 기업은 단순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채권을 새로 발행하고 있다. 이날 7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빙그레는 조달 금액 중 4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 조달 자금을 올해 4분기 낙농진흥회, 낙농가, 삼양사, CJ제일제당 등에서 매입하는 원유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매입 대금이 부족하면 내부 보유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도 다수다. 25일 25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롯데칠성음료는 발행액 전액을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 과거 다수의 증권사에 빌린 기업어음(CP)을 비롯해 1100억 원 규모로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55-2회 공모 회사채를 차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55-2회 공모 회사채는 이자율이 1.55%에 불과하지만 이번 채권 발행에서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된 금리는 2.79~2.99%다. 더 높은 금리를 줘가면서 과거 빚을 갚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기업부채는 꾸준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줄어들었다. 1분기(-0.4%)에 이어 순감 기조를 이어간 것인데 은행권 대출 등을 포함한 기업부채는 270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무보증 공모 회사채는 보통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기업이 발행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 PF나 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주가수익스와프(PRS) 등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숨은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규모는 더욱 크다. SK이노베이션과 소속 자회사는 올 들어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2조 3000억 원 규모의 PRS와 3조 원 규모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했다. 이들 금융 상품은 계약 만기 시 주가가 기준가(최초 매입 단가)보다 낮으면 매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해 자본보다는 부채 성격이 짙다.
국내 증권사 부채자본시장(DCM) 본부장은 “과거 조달한 차임금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기업 외에도 경기 불확실성 속 자금을 확보하려 움직이는 곳들도 다수”라며 “PRS 등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부채 규모는 과소 집계된 측면이 있어 특정 산업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시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avity@sedaily.com
grav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