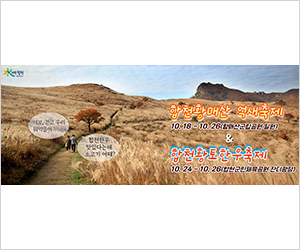홈플러스 매각 측이 스토킹호스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한 것은 매각 작업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력 후보들의 이탈과 불리한 재무 구조 탓에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입찰이 본격화되면 의외의 원매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1일 금융투자·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주관사 삼일PwC는 추석 연휴 직후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선다. 법원이 올 6월 인가 전 M&A를 허용하며 매각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주요 원매자들이 연이어 발을 빼면서 스토킹호스 파트너를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과 주관사는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보고 일반 경쟁입찰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쿠팡은 사업 전략과 맞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농협은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의 상권이 겹치는 데다 국산 농축산물 중심 정책과의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CJ와 다이소 등도 내부 검토 끝에 인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를 매각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현재 홈플러스의 총 차입금은 약 5조 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점포 임차료 성격의 리스부채가 3조 4000억 원, 금융권 차입이 2조 원대에 달한다. 인수자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상당한 데다, 국민연금 투자금도 부담 요인이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에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5826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295억 원은 보통주다. RCPS는 지난 10년간 배당으로 원금의 절반 이상인 3131억 원을 회수했지만, 약 2700억 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보통주 투자분 295억 원은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가치 평가도 인수자의 발목을 잡는다. 삼일PwC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3조 6816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 5059억 원을 크게 웃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했을 때 자산 회수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원매자들의 매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보유 자산 구조 역시 청산 유인을 뒷받침한다.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약 4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토지 가치만 3조 원으로 평가된다. 인수자로선 영업 정상화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청산을 통한 자산 회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책임론을 의식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2000억 원은 MBK의 운영수익에서 충당할 추가 증여분이고 나머지 3000억 원은 연대보증과 이자 대납, 무상 소각, 김병주 회장의 개인 출연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거래가는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도는 구조 탓에 원매자 협상력이 높아져 입찰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추석 이후 진행되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분할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지연될 수록 납품업체와 노조,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도 현실화할 수 있다” 며 “10~11월이 홈플러스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ood4u@sedaily.com
good4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