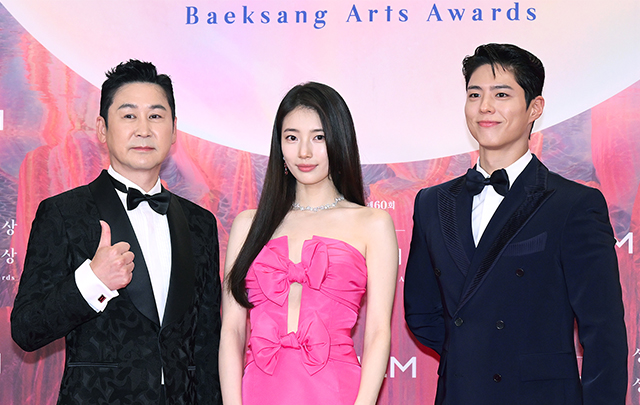오늘(3일) 방송되는 KBS1 ‘다큐 공감’에서는 설 특집 ‘노란대문 집’ 편이 전파를 탄다.
평일은 광주로, 주말은 영암으로, 두 집 살림하는 부부가 있다. 매주 58Km를 달리자면 힘들 법도 하건만, 어쩐지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들뜬다는 미암면 댁 아들 박홍렬(68세) 씨와 아내 이영란(65세) 씨. 박홍렬 씨의 어린 시절 집이자, 부모의 집이었던 곳. 그러나 지금은 마중 나오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집. 어머니 작고 후 잡초만 무성하던 이 집에 담긴 추억이 그리워 다시 보살피게 되었다는 노란대문 집.
▲ 아버지의 텃밭, 아들이 씨를 뿌리다.
월출산의 아름다운 산줄기를 타고 훑어내려다 보면 동네 사람 모두가 일가친척인 마을을 마주하게 된다. ‘배바위 마을’로도 불리는 이 집성촌에는 유독 눈에 띄는 샛노란 대문 집 한 채가 있다. 부모님 작고 이후 10년간 고요함만 가득하던 집에 따스한 기운이 스미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중등학교 교장이었던 박홍렬 씨가 퇴직한 이후부터다. 교직 생활 38년. 집안일이라고는 당최 알지 못했던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텃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농사철에 그 시기를 모르는 사람 보고 철모르는 놈, 철없는 놈 하잖아요. 시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철모르는 첫 농사가 어려웠을 법도 한데, 지금의 1,322m²(약 400평) 가량 되는 텃밭을 잘 가꿀 수 있던 이유를 물으니 오면가면 관심 가져준 이웃 친척들 덕분이란다.
어느덧 손주들까지 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이곳 배 바위 마을에서만큼은 언제까지나 새신랑이요, 새댁 대우를 받는단다. 울타리 건너 한 집, 골목길 꺾어 한 집. 모든 집이 친척 어른들이기 때문이다.
”다 집안이죠. 여기는 요리 오면 아짐, 저리 가면 아재, 조리 가면 형님, 저기 가면 질부고.. 남이 없어요“
▲ 월출산 아래 추억에 젖어들다.
“집도 사람도 봐주지 않으면, 다 헐고 무너져요“
은퇴 후 고향에 왔으니 여유를 느끼며 살 법도 하건만 박홍렬 씨 부부, 낡은 고택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모습을 따라 열심히도 살고 있다. 안채에 앉아 먼지 쌓인 부모의 놋그릇을 정성 들여 닦던 박홍렬 씨를 보며 이웃 형수가 말을 건넨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쓰던 것이라고, 하나도 안 내뿔고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이 아니여“
습기 머금어 무너지는 방도, 뜨락 앞 어머니의 장독대도, 쥐가 갉아먹은 마룻바닥도. 모든 것이 손 봐야 할 것들이지만, 지나간 시간이 서려 있는 고물 아닌 보물. 노란대문 문턱 넘어 인생 회고전이 펼쳐진다.
▲ 해묵은 그리움. 어머니의 음식
관련기사
40년 지기 벗이자 아내인 이영란 씨가 오늘도 음식을 만들고 있다. 박홍렬 씨가 직접 농사지은 작물에 이영란 씨의 야무진 손이 더해지니 어느덧 정갈한 밥상이 차려진다. 별 것 없는 재료를 대충 무치고 끓여내던 음식. 쉬이 만드신 것 같던 촌스럽고 투박하기 그지없던 음식인데 수백 번 수천 번은 먹었던 그 음식이 한평생 가장 좋았더라 남편은 말한다. 요리 꽤나 만든다는 이영란 씨조차 맛 내기 힘든 이 음식은 어머니의 음식이다.
“저희 시어머님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박스러워요. 멋은 없는데 깊은 맛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의 음식이 그렇잖아요.“
멋 내기는 쉬워도, 맛 내기는 어려운 음식. 입맛은 혀 속 깊이 품고 있는 기억의 또 다른 형태이다. 제철에 맞는 재료를 큰 손으로 조물조물 무쳐내던 시어머니. 그 옆 쪼그려 앉아 같이 밥상 차리던 며느리. 함께 지냈던 26년의 세월만큼 자연스레 맛도 조리법도 뒤쫓게 되었다는 이영란 씨. 그녀가 시부모를 그리는 방법은 음식이다.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입맛을 전해주다
주암마을 노란대문 집에 고소한 깨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이 집에서 ‘요술 가루’라고 부르는 곱게 빻은 깨소금에서 나는 향기다. 어머니가 갈아주신 깨와 소금을 비벼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자식을 걸쳐 손자까지도 좋아하는 전통 있는 음식이 되었단다. 재료 하나, 요리 방법 하나 바뀐 것 없는 음식이지만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하던 절구질을 박홍렬 씨가 하고 있다.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람도 따라서 해주고, 우리 애들이 ‘요술 가루’라고 그래요“
어렸던 아들, 박홍렬 씨가 기억하던 입맛은 기억을 넘고 대를 걸쳐 지금까지도 가슴 속 온기를 지피고 있다.
▲ 시간의 부등호가 바뀌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어머니가 보고파서 찾아온 고향 집.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주걱도 어느새 둥글게 닳아버렸다.
“사람은 떠나고 물건만 남았어...”
쪽머리 곱게 넘겼던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흔적과 같이 늙어간다는 박홍렬 씨. 어느덧 부모 곁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렸다. 언제나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곳. 빠르게 흘러가는 바깥세상과는 다르게 노란 대문집 안에서 만큼은 시간이 꼭 천천히 흘러간단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음식에 담아 ‘턱’ 하니 올려놓던 ‘엄마표 밥상’, 그 밥상이 절실히 그리워지는 설이 어느새 찾아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