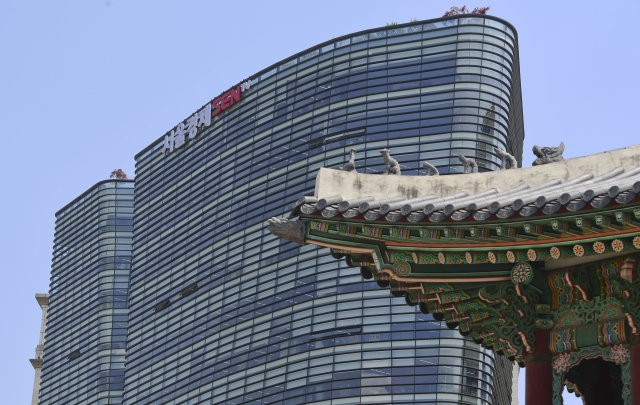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01년 4월 국내 첫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다. 2002년 6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정부 지분 11.8%를 팔았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영화가 시작된 것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네 차례 블록세일을 통해 정부 지분은 약 57%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10년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들어서부터 본격적인 경영권 지분매각을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자산 400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의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이 12년째 정부 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금융의 올바른 민영화는 국내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일이다. 우리금융에는 대기업 같은 기업대출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은행과 옛 LG투자증권이 모체인 우리투자증권이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예금보험공사 아래에 있다 보니 은행 및 계열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각종 외압에 따른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복마전식' 인사가 이뤄지는 것도 민영화 불발의 후유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금융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나올 대우증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민영화=최근 우리금융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요구에 민영화 작업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상황에 빠졌다. 당장 우리금융 민영화의 전초전인 지방은행 매각이 쉽지 않다. 해당 은행을 지역에 돌려달라는 것이나 특정 지역기반 은행에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정치적 요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들도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는 겉으로는 찬성하는 것 같아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표를 생각하면 경남 지역 민심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을 걸겠다고 하지만 지역민심을 생각하면 최고가 입찰원칙을 통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세 번이나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영화, 정부도 오락가락=우리금융을 이른 시일 안에 시장에 돌려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금융당국도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정책을 펴온 게 사실이다. 진 전 위원장 때는 병행매각(일괄+분리)을 추진했다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두 번의 일괄매각을 시도했다. 진 전 위원장 시절에는 입찰상황에 따라 분리매각을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의 전 고위관계자는 "진 전 위원장 때 병행매각을 해 지방은행을 따로 팔려다가 정치적인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이 때문에 일괄매각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매각을 성사시키려다 보니 과거에 안 된 방법은 버리고 새 방안을 찾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 들어 일괄매각 방침을 버리고 다시 분리매각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뒤로 밑그림을 다 짜놓은 뒤 형식상 입찰을 한다는 불만도 있다. 국내 금융산업에 중요한 딜인 만큼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넘기려고 했던 사례 등은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조조정 나올 때마다 정치적 잣대 등장=구조조정이 정치적 잣대로 움직이는 것은 비단 우리금융뿐 아니다. 환란 이후 동남ㆍ대동은행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적 논리와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정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진도를 다 빼놓고 임자를 만들어놓아도 지역주의 앞에 서면 무용지물이 되곤 했다"며 "정치적 잣대가 존재하는 한 우리 금융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은 다른 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TX 등은 물론이고 과거 중요한 기업 처리 때마다 지역 문제와 노조의 등쌀에 구조조정이 산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경제논리로만 판단...매각 서둘러야=금융계 관계자들은 '경제 논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으며 우리금융 매각 작업은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의 공적인 속성상 대주주 적격성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지방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매각작업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계열사 매각시에는 최고가 원칙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만 매각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은 정부가 매각 주체가 되면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운영 주체가 확실한 컨소시엄에 파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투자이익을 주로 원하는 사모펀드보다는 금융사와 투자자들이 연합한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제대로 된 민영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금융 민영화가 잘 돼야 증권업계의 대어인 대우증권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