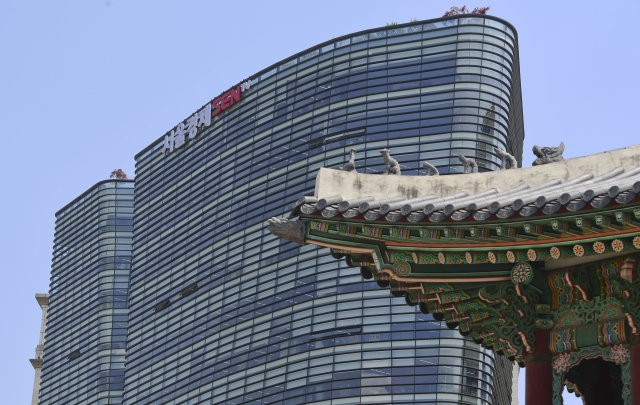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
미국 경제가 지난 5년간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하는 사이 미국인들의 소득격차는 192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이매뉴얼 사에즈 UC버클리대 교수가 1913년부터 2012년까지 미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가계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2.5%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공황 직전 미국의 증시 거품이 최고조에 달한 1928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상위 10%의 소득비율은 48.2%를 기록해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에즈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사에즈 교수는 그 원인으로 최근의 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회복, 기업이익 증가를 꼽았다. 소득 상위 10%가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2009년 바닥을 찍은 이래 상승한 주가 시세차익과 기업 배당은 부자들에게로 집중됐다. 내년 1월부터 자본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데 대비해 부유층이 주식을 서둘러 현금화한 것도 소득증가에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에즈 교수는 자본소득 비중이 높은 부자들이 금융위기를 전후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직격타를 맞았지만 지난해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급격한 소득상승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 1%의 소득은 2007~2009년에 36% 이상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0%나 급증했으며, 특히 상위 0.01%의 소득은 지난해 32%나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소득 비중이 높은 하위계층은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도 임금상승에 제약이 있어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사에즈 교수는 "갈수록 확대되는 소득 불균형을 이대로 놓아둘 것인지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면 사회제도와 세금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