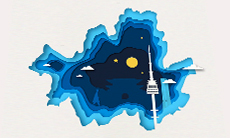|
“‘무대 미술가’라는 말은 빼 주세요.‘무대미술가’는 전문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지, 난 그냥 영원한‘뒷 광대’입니다. 깜깜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내는 게 더 편합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예술가 이병복(86·사진)은‘뒷 광대’를 자처한다. 배우와 연출가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어두컴컴한 무대 뒤가 자신이 가장 자유롭게 예술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 믿기에 말이다.‘뒷 광대’로 늘 자신을 낮추지만 그는 국내에‘무대 의상’과 ‘무대 예술’이라는 개념을 정립 시킨 1세대 미술가로, 한국 현대 연극사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1966년 4월 연출가 김정옥과 의기투합해 극단‘자유’를 창단했고, 1969년에는 남편 고(故) 권옥연 화백과 사재를 털어 연극 전용 소극장‘카페 떼아뜨르’를 개관해 소극장 운동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무대 미술가로 40여 년의 연극 인생을 걸었던 그의 발자취를 한 번에 조명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동숭동 아르코 미술관에서‘이병복, 3막 3장’이라는 주제로 실제 그가 무대에 활용했던 무대 소품과 그간 직접 수집한 자료, 현재 그의 시선을 녹여 만든 최근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30일 오전 서울 아르코미술관에서 만난 그는 마지막 전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한 작품을 맡아 무대 작업을 책임지기에는 나이도 있고 겁이 나더군요. 하지만 늘 일하고 싶은 마음은 한 켠에 자리하고 있고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다 보니 종이를 가지고 이리저리 주물럭거렸죠. 그렇게 한 동안 시간을 보내며 만든 작품, 지금까지의 작품을 함께 모아 선보이게 됐습니다. 주책 맞게 괜히 다 펼쳐놓고 망신당할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이병복의 예술 세계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최소한의 소도구와 조명만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매력이 있다. 그는 한지·삼베·탈·인형·천 등 전통적 재료를 무대 의상과 소도구 제작에 적극 활용해 독특한 멋을 살렸다. 유독 한지 등 종이를 작품에 적극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종이에는 요기(妖氣)가 있다. 배우들이 종이 옷을 입고 무대에서 동작하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참 요사스럽고 오묘한 매력이 있다”고 표현했다.
올해로 86세인 예술가 이병복은 지금도 변함없이 서울 장충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무의자(無依子) 박물관 내 작업실을 오가며 예술 혼을 불태우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병복이 40년 연극 인생을 돌아보며 한지에 풀을 붙여 만든‘초심(108개의 부처)’와 우리네 어머니의 자화상을 녹여 만든‘어머니의 삶’등 최근작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병복의 개인사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일기와 드로잉, 유학시절 그린 자화상뿐 아니라 그가 1960년대부터 사용해온 작업대도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