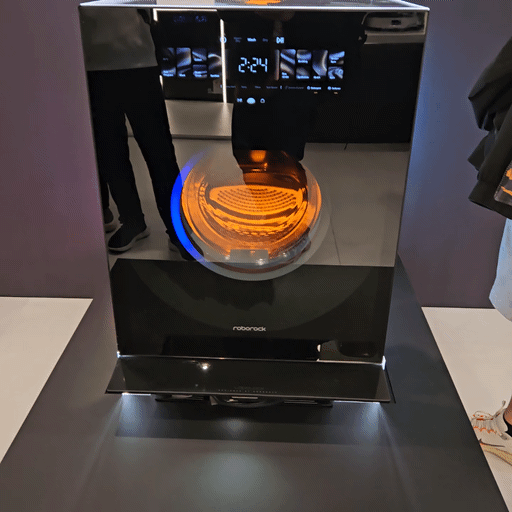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
국내증시가 사상 최장기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혹은 올해초 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조정을 대비해 환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앞서고, 이렇다 할 펀드투자를 감행하지 못한 이들이라면 “지금 들어가봤자 얼마나 먹겠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해외펀드의 경우 하루건너 새 상품이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할지도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해진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조언은 ‘정석에 기반한 요령’이다. 장기투자ㆍ분산투자라는 해묵은 원칙은 굳건히 세워둔 뒤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란 얘기다. ◇국내펀드, 환매냐 가입이냐 =가장 큰 고민은 국내펀드 처리여부다. 최대수익률을 내려면 물론 조정장 직전에 펀드자금을 환매, 이익을 실현한 후 저점에서 다시 펀드에 가입하면 되겠지만 ‘신(神)도 모른다’는 주가향방이 문제다. 이럴 때는 환매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할만하다. 강규안 한국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펀드에 가입해 높은 누적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한번쯤 이익실현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지수상승세를 감안, 전액환매보다는 50%안팎을 환매해 차익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절반가량은 남기고 나머지 현금은 유망시장에 새로 투자할 경우 수익률 제고와 분산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가입시기 부담에서 자유로운 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병훈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분석팀 과장은 “거치식 투자는 가입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자금을 나눠 가입하는 적립식 투자가 안정적이다”고 소개했다. 다만 펀드 종류는 최근 채권형 펀드의 부진을 감안할 때 주식투자비중이 60~70%이상인 성장형펀드를 선택하라는 조언이 많다. ◇해외펀드, 이머징시장이 더 유망=지난해 중국펀드 열풍을 이어받아 올초에는 일본, 유럽 등 선진시장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추천됐지만 최근 이 같은 전망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마켓의 강력한 성장세에 비해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극히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어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집계에 따르면 5월29일 기준 중국투자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15~20%, 베트남펀드 수익률은 9~13%까지 나오고 있지만 일본투자펀드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서유럽펀드 수익률은 3~6%대에 그치고 있다. 이병훈 과장은 “일본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을 짧게 설정한 이들에게는 관련펀드 가입이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마켓의 성장세가 올해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외펀드 투자의 제1원칙인 ‘분산투자’는 잊지 말고 지켜야 할 대목이다. 단순히 구가별 투자비중만 나누기보다 상품별 연관성이 적은 펀드를 나눠 가입하는 게 요령이다. A사의 중국펀드, B사의 친디아펀드에 모든 자금을 쏟아 붓고 충분히 분산투자 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섹터펀드, 꼼꼼히 들여봐야 = 지난해 최대 히트상품이 중국펀드였다면 올해는 섹터펀드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초부터 5월25일까지 섹터ㆍ테마펀드 등으로 몰린 돈은 무려 2조5,700여억원에 달해 전체 해외펀드 증가분의 23%이상을 차지했다. 지수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주식형펀드와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펀드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수익률로만 보면 섹터펀드 가운데 인프라펀드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5월25일 기준으로 3개월 수익률이 최대 17%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섹터펀드 중 상당수는 실물이 아닌, 특정영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펀드들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늬는 테마, 섹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식형펀드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수익을 내온 일부펀드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허진영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섹터펀드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주식형펀드의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며 “아울러 자신의 투자목적이나 기간, 자산배분 현황에 부합하는 상품인지 먼저 검토해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