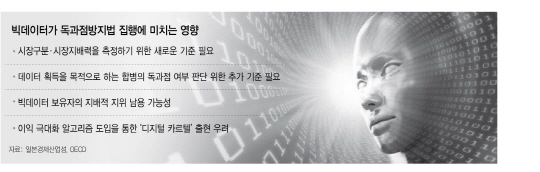# “우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요금을 최대 8배나 높여 받는 담합을 중단하라!”
지난 2015년 12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이용객인 스펜서 마이어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우버와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담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우버가 기사들과 공모해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혼잡시간대에 비싼 요금을 제시하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버의 인공지능(AI)이 좌우하는 가격 산정 알고리즘에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의 AI가 산정하는 가장 ‘적절’한 요금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 차량 이용 요금 폭등을 초래한 것이다.
세계 각국 기업들의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간인 아닌 기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을 산정하는 신종 담합, 일명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지털 카르텔이란 디지털 기술에 바탕한 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버 원고인단 역시 이 회사의 가격산정 시스템이 운전자들의 가격 카르텔(담합)을 초래해 과도한 이익을 누렸다는 점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이론적으로는 우버 기사들은 운송을 담당하는 개별 사업주이기 때문에 경쟁자인 일반 택시는 물론 우버 차량끼리도 요금을 두고 경쟁해야 하지만, AI는 차량 이용객이 증가하는 특정 시점에 요금을 8배까지 뛰어오르게 만들어 운전자들의 ‘비자발적’인 담합을 낳은 셈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물인터넷(IoT)의 발달과 함께 AI에 의한 신종 담합행위가 서비스업은 물론 그 외 산업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서플라이 체인(연쇄 생산·공급망) 최적화 작업을 추진하던 일본의 한 기업의 경우 고도화된 네트워크가 의도치 않게 독과점방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재고를 줄일 목적으로 제품 및 부품 조달 기업을 연계하고 AI를 통해 발주와 생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경우 재고를 털기 위해 ‘떨이 판매’를 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이 오르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 경제가 고도로 통합된 네트워크 아래에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디지털 경제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사라질 수 있다”며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소비자가 치를 비용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에는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 담당 위원이 디지털 카르텔의 위험에 대한 연설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가격 산정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디지털 카르텔의 경우 기존 카르텔처럼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의 공정경쟁 정책에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인 또는 기업 간에 가격 유지 및 인상 등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합의해야만 담합행위로 판단하는 현행법상 AI가 네트워크상에서 습득한 정보를 합의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의 결정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빠른 속도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따지기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각국 규제당국도 인간이 아닌 AI가 가격 결정 등의 주체로 등장하는 데 따른 새 공정경쟁 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카르텔을 방지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세계 주요국의 독과점방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OECD는 “스스로 학습해 다른 기계와 협조하는 AI가 나서는 상황에서는 기업 간 가격 조정의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면서 “AI의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에서 담합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각국의 독과점방지법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