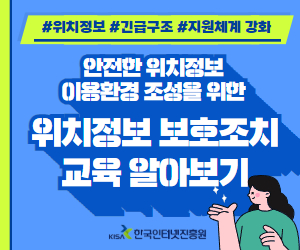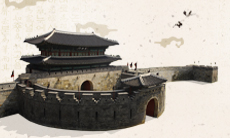경기 성남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A군은 입학 직후 외모 비하 등 다른 반 학생들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됐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의 중재로 1년여를 참아온 A군은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해 4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들에 내려진 건 접근금지 조치가 전부였다. 하지만 A군은 조치 이후에도 공황발작을 겪어 응급실로 후송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
A군 사례처럼 기존 학폭위 체제에서는 피해학생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처분이 나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학부모위원의 비전문성 문제까지 교내 학폭위를 향한 잡음이 이어지자 지난해 교육부는 다가올 새 학기부터 교내서 열리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짓는 평가 기준을 그대로 두고서는 피해학생을 울리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원하는 피해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학폭위 조치 건수 4만9,933건 가운데 피해학생이 재심을 요구한 건수는 1.6%인 799건에서 이듬해인 2017년 1.9%(1,186건)로 늘었고 2018년에도 다시 2.1%(1,422건)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 단위에서 열리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기로 했다.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조치의 객관·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위원들이 피·가해학생 부모들과 친분이 있다보니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지는 미지수다. 학폭위가 열리는 공간은 달라지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위원들은 ‘가해학생조치별 적용세부기준(적용기준)’에 의거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 5개 요소가 기준이 된다.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서면사과부터 강하게는 퇴학까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1~5점 척도로 매기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위원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에 따라 처분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똑같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라도 학교마다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학폭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축적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보니 피해학생들에게 억울할 수 있는 처분이 종종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반성·화해 항목의 현행 반영률이 가해학생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폭위 목적이 교육적 해결에 있다지만 가혹한 폭행이 오간 후 실제 가해 학생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리는 시점에 반성 의지를 내비치기만 하면 처분이 가해학생들의 입장에 치우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며 부가 요소까지 고려되면 실제 비중은 이보다 통상 높다. 차용복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은 “피해학생들이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지만 학폭위 단계서 이를 확인하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반성·화해 항목이 5개 중 2개 항목을 차지하는 기준이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jin@sedaily.com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