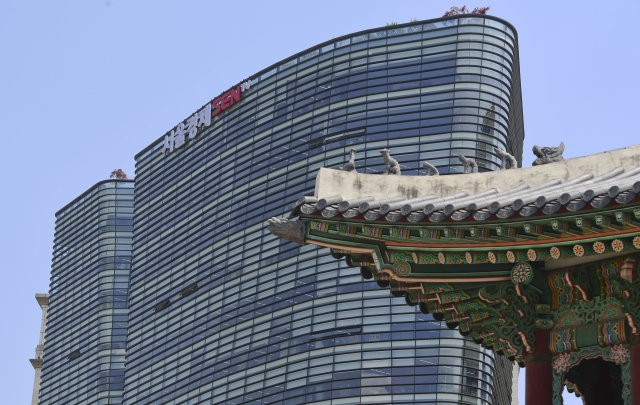고향 떠나 서울로 향한 지 11년 만에 마침내 ‘서울’에 입성했다. 비록 ‘영끌’ 대출에, 아파트 아닌 빌라 입주이긴 하지만, 수도권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서울 유주택자’가 된 동원(김성균)은 가슴이 터질 듯이 행복하다. 하지만 이사한 지 2주일 만에 악착 같이 모아 마련한 ‘내 집’이 통째로 500m 싱크홀 아래로 떨어진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캄캄한 땅 속에 갇힌 동원. 머리 위로 아득하게 먼 하늘이 작고 희미한 점처럼 보일 뿐이다. 이제 동원에게 가장 큰 목표는 집이 아니다. ‘생존’이다.
오는 11일 개봉하는 영화 ‘싱크홀’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주거 불안과 갑자기 들이닥친 초대형 재난의 공포를 한 데 엮은 작품이다. 물려 받은 재산 없이 맨 손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지 알기에 새 집 거실에 앉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원과 그의 부인, 아들의 기쁨이 스크린 밖까지 전해진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백 번 천 번 뽀뽀하고 싶을 정도로 꿈 결 같이 좋았던 ‘내 집’이 갑자기 엉망진창이 돼 땅 속으로 사라진다.
평범한 빌라 이웃들도 동원과 함께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만수(차승원)는 동원에게는 까칠하지만 취준생 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 ‘쓰리잡’까지 뛸 정도로 열심히 산다. 일 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노모 봉양에 청춘을 저당 잡힌 남성도 있다.
동원의 집들이에 왔다가 함께 싱크홀에 빠진 직장 후배들 역시 현실감 넘치는 인물들이다. 집이 없어 사랑 고백을 못하는 김 대리(이광수), 정규직만 받는 명절 선물이 부러운 인턴 은주(김혜준) 등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힘든 젊은이’다.
이들은 제각각 다른 고통과 사연을 안고 살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결국 같은 꿈을 갖게 된다. 바로 ‘살아서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네 탓 내 탓 할 시간이 없다.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결심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될 수 도 있다.
싱크홀 속 생존 사투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마냥 무겁거나 어둡지 않다. 긴박한 상황이 때로는 어이 없이 웃기고, 절절한 대사가 황당한 농담이 되기도 한다. 재난 상황과 B급 유머 코드를 접목하는 게 쉽지 않은 연출이지만, ‘어려울 때 서로 원망하기 보다는 원 팀이 돼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영화적 도전을 결심 했다는 게 김지훈 감독의 설명이다. 지상 108층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 사건을 다뤘던 ‘타워(2012)’로 518만 관객을 동원했던 김 감독은 이번엔 땅속 500m 생존기에 도전했다. 김 감독은 타워에서는 재난에 힘을 줬던 것과 달리 싱크홀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의 연대를 부각한다. 배우들은 각각 제 몫의 연기를 한다. 누구 하나 특별히 눈에 띄기 보다는 함께 함으로써 상대 배역을 더 빛나게 한다.
다만 재난 발생 전후의 서사가 늘어지는 점은 아쉽다. 관객이 ‘이게 말이 돼?’ 등 과학에 기반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영화의 재미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 재난 상황보다는 평범한 이웃의 생존 분투기와 연대에 무게 추를 둬야 영화적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러닝 타임 114분, 12세 이상 관람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