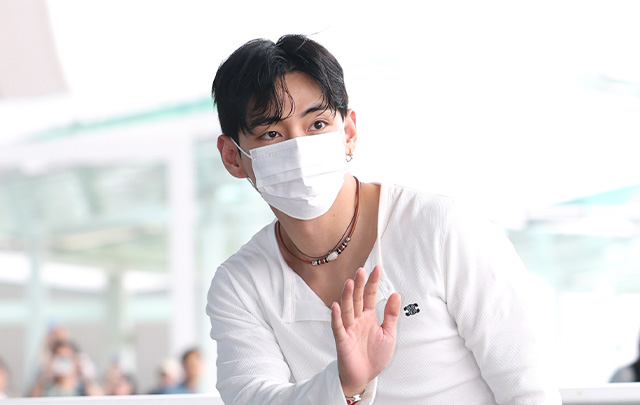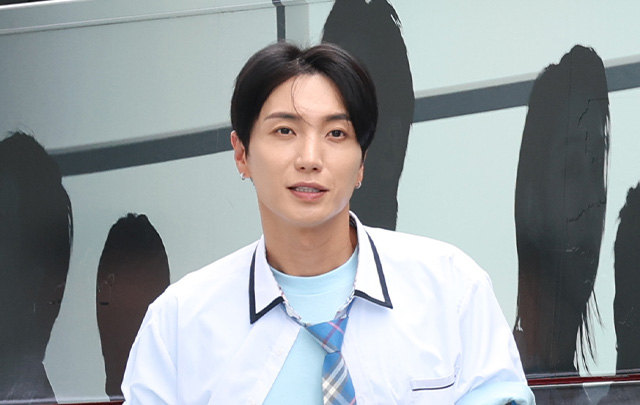찬란한 LCD 평면 TV가 있는데 굳이 흑백 TV를 찾을 일이 없듯 말이다. 철학이나 사회학 같은 분야에서는 옛날에 나온 고전을 읽고 또 읽지만 기술공학 분야에서는 업데이트되기 전의 낡은 교과서는 헌 책방에서 무게로 달아 팔 뿐 아무 효용이 없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진보와 기술혁신의 이면에는 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전혀 다른 면모가 숨겨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사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것을 모양만 다르게 한다든가 조합만 바꿔 놓은 것이 많다.
반복이란 지겨운 것이지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다. 같은 바위를 계속해서 언덕 위로 밀어 올리지만 또 굴러 떨어지는 시지프스의 신화는 실은 테크놀로지의 숨어 있는 면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반복에 대해 얘기했다.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트는 인간 개체가 하는 일이란 인간 종의 전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개의 인간은 그 자신이 잘 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되풀이 되는 일들을 개인의 차원에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발명이나 발견 같은 업적이든, 살인 같은 죄악이든, 사랑과 미움 같은 감정의 표출이든 말이다.
형태를 바꿔서 반복되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에서는 어떤 반복이 있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노드롭 항공은 1946년에 'XB-35'라는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항공기였다.
그것은 소위 플라잉 윙(flying wing)이라고 불리는 형태로서 꼬리날개가 없이 오로지 날개로만 되어 있고, 동체도 날개 속에 파묻혀 있는 형태였다.
이런 형태의 항공기는 날개의 표면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평 꼬리날개와 수직 꼬리날개가 없는 형태 때문에 항공기의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없어 이 모델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그 후 개량형인 ‘YB-49’를 만들지만 이도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노드롭의 집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용화에 실패한 YB-49는 처녀비행 후 거의 40여년이 지난 1989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으로 다시 태어난다. 플라잉 윙의 형태는 결국 반복된 것이다.
하지만 B-2 스피릿이 YB-49의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랬더라면 B-2 스피릿은 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외형상 YB-49의 플라잉 윙 형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 B-2 스피릿이 성공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40년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행제어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꼬리날개가 없는데서 오는 자세의 불안정성을 B-2 스피릿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제어로 극복한다.
즉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까다로운 운동특성을 컴퓨터가 대신해주었기 때문에 YB-49는 B-2 스피릿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반복된다. 그러나 형태를 바꿔서 반복되는 것이다.
모든 기기는 흑백에서 컬러로
사실 테크놀로지의 반복이라는 주제는 필자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컴퓨터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큐레이터에게 들은 얘기다.
컴퓨터야말로 가장 빠르게 진보하면서 과거를 내던져 버리고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테크놀로지다. 하지만 컴퓨터 역사박물관의 큐레이터는 흑백 모니터의 예를 통해 반복되는 테크놀로지를 설명했다.
지난 1980년대 초반 한국에 컬러 TV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눈도 빠르게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다. 사람들 옷 색깔이나 자동차의 색깔도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다.
1980년대 중반 현대자동차의 스쿠프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찬란한 파란색에 매료됐던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한국에서 흑백이란 1970년대 이전 근대화 초기에나 있었던 새마을운동 같은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 컴퓨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니터는 다시 흑백이었다. 인텔 XT급의 프로세서에 도스를 운영체제로 하고 있으며, 하드의 용량이 400메가 정도 하는 컴퓨터였다.
필자 같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을 치는 사람도 한글을 치고 나서 모니터에 글자가 뜰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려야 했던 ‘곰퓨터’였다. 그 정도의 컴퓨터에 흑백 모니터는 어찌 보면 어울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컬러 모니터가 일반화되면서 흑백 모니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모니터는 다시 흑백이었다.
이제 모든 노트북 컴퓨터는 컬러 모니터를 장착하게 됐다. 그래서 구닥다리 흑백 모니터는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핸드폰이 나오면서 흑백은 재차 살아난다. 초기의 핸드폰에는 흑백 모니터가 달려 있었던 것이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모든 핸드폰의 모니터가 컬러로 바뀌었다. 우리가 볼 때 흑백은 컬러에 비해 당연히 원시적이고 뒤떨어진 테크놀로지다.
하지만 마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악몽이 자꾸 되살아나듯 흑백 모니터라는 구닥다리 테크놀로지는 자꾸 되살아나고 튀어나온다.
아직 흑백 모니터를 쓰는 영역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자. 복사기의 디스플레이는 아직 흑색이다. 이것도 언젠가는 컬러로 바뀔 것이다.
전혀 다른 현상에 같은 원리가 반복
이런 반복 현상들은 누가 주도하는 것일까. 그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주체는 아닐 것이다. 두 현상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반복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옛날에 남해안에 갔을 때 목선을 탔는데, 배 뒤쪽에서 노 젓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배의 노는 수면에 대해 15도 정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닿아 있고, 뱃사공 아저씨는 그 노를 8자로 저었다. 어떤 자세에서도 노는 수면에 대해 비슷한 각도를 가지고 있었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베르누이의 정리였다. 노의 단면은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은 형상으로 돼 있었고, 뱃사공 아저씨가 8자로 노를 저으면 배를 뒤에서 앞으로 미는, 일종의 양력(揚力, lift)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런 형태는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 남해안의 시골 사공 아저씨가, 혹은 그의 배를 지어준 장인은 어떻게 베르누이의 정리를 알았을까. 경험으로 터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다.
오늘날 항공기 날개에 적용되는 베르누이의 정리와 남해안의 목선에 적용되는 베르누이의 정리는 그 동기와 연원은 전혀 다를 것이다.
신기한 일은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패러다임 차원에서 서로 다른 현상에 같은 원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같은 것의 반복과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대립되는 두 가지 현상이 교묘하게 얽혀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글_이영준 추계조형예술대학 사진예술학과 교수, 기계비평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