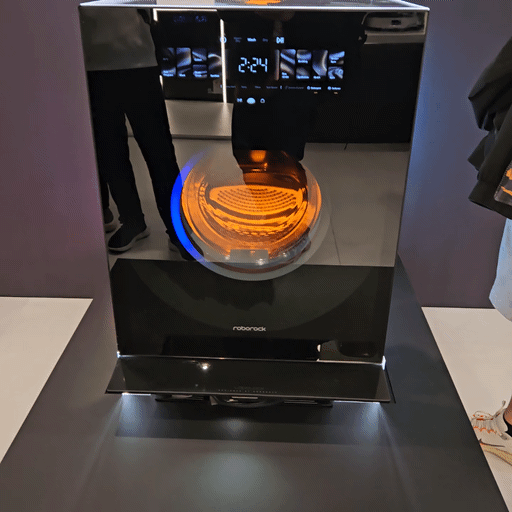숨 돌릴 틈 없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자청해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겠다고 했다. 모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조건은 완벽했다. 그가 도착하기 20분 전에 강의실은 이미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200여명의 학생들로 후끈 달아올랐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은 궁금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이민자의 신분을 뛰어넘어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었는지 말이다.
이런 기대를 눈치챘던 것일까. 김 총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참 기쁩니다"라며 한국말로 인사했다. 발음은 좀 서툴렀지만 그가 모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은 환호했다.
아이들은 순수하다. 초기와는 달리 강의가 중반을 넘어서자 집중력은 떨어졌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아이, 문제집을 푸는 아이, 옆 친구와 잡담을 나누는 아이 등 행동은 제각각이었지만 같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인 건 잘 알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물론 이날 사회를 본 남녀 학생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담당했던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수준급이었다. 김 총재도 이들만 보면 교장선생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놓친 게 하나 있다. 미국인인 김 총재 앞에서 '우리 학생들 영어 잘해요'라고 자랑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의 강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을지 고민했어야 했다.
학생들에게 이해하는 척하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강요하기보다 김 총재에게 서툰 한국말도 좋으니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 아닐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