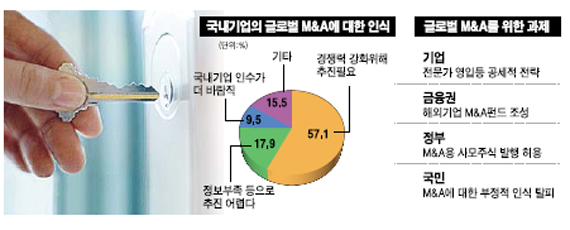|
유기 및 무기화학 업체인 동양제철화학도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초대형 M&A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솟을 기회가 있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11월 당시 세계 3위의 카본블랙(타이어용 고무) 생산업체인 컬럼비아케미컬즈컴퍼니(CCC)를 인수하기로 했다. 양사는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사실상 최종 사인만 남겼지만 결정적인 순간 공정거래법 때문에 CCC M&A건을 ‘없던 일’로 돌렸다.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게 되면 해당품목 국내시장 점유율이 64%에 달해 곧 바로 독과점방지 규제에 저촉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통해 영토확장 전쟁을 치루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신천지를 향해 잰걸음을 옮기고 싶지만 자칫 조금만 속도가 붙어도 곧 바로 ‘엘로카드’가 날아오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원칙’ 더 이상 덕목 아니다=97년 이후 글로벌자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완화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M&A시도는 이러저런 규제의 틀에 묶여 제자리걸음 상태다. 실제로 국내기업이 해외 M&A를 시도할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나아가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국내 사모펀드의 해외 투자목적회사의 국내 설립 금지나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제한 역시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 M&A 시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방벽이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원칙은 글로벌 M&A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을 좌절시키는 가장 큰 제약이다. 좋은 물건이 등장하면 탐내는 곳도 많은 법. 결국 마지막 승부는 자금조달 능력에서 결정되곤 한다. 누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한결같이 이 부분에서 절름발이다. 국내에도 풍부한 유동성이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엔 제약이 너무 많아 외려 국내금융을 일으키는 것보다 해외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손쉽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금산분리의 원칙은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한 금융과 산업간 공동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내 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기업의 적대적 M&A 방어의 어려움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해외기업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금산공조’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투자 대상 리스트엔 상당수의 국내기업들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올라가 있다. 소버린펀드가 SK㈜를 대상으로 펼쳤던 적대적 M&A시도나, 그보다 앞서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진행했던 것들은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 같은 M&A공격이 국내기업만을 향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는 일상사란 점. 실제 2000년 영국 보다폰의 독일 만네스만 인수, 독일 에너지업체인 E.On의 스페인 앤데사 인수 등 최근 4년간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적대적 M&A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M&A 공세”라고 입을 모은다.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덩치를 키워 쉽게 덤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탈의 M&A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도 인도ㆍ베트남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광권 확보로 시가총액이 올라가며 한숨 돌리는 상황이다. 물론 공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책은 마련돼야 한다. 재계가 입이 아플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의결권 추가부여제도, 인수자에게 자금부담을 안기는 독약조항(Poison Pills) 등은 글로벌 M&A에 나설 국내 기업에 최소한의 방범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M&A를 통해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안정된 경영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