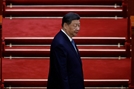박희태 국회의장은 자신의 사퇴를 알린 9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을 통해 사퇴의 변을 전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국민 사과조차 대독하게 하는 입법부 수장의 퇴장을 보니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박 의장의 사퇴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박 의장이 거론된 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장직 사퇴를 종용했지만 그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의장직을 고수했다. 그 사이 우리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의 국회의장실 압수수색 등 국회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신의 수족이었던 전 비서 고명진씨의 편지 한 장으로 그는 권력의 뒤안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고씨가 편지에서 "책임 있는 분이 권력과 아랫사람의 희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힌 대목으로 박 의장은 더 이상 버틸 명분도,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잃어버렸다.
박 의장은 이날 한 대변인이 대신 나온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한 대변인은 "행간을 읽어주길 바란다"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 굳이 행간을 읽어본다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 혹은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내 선에서 끝내주길 바란다'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두 해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쪽은 국민에 대한 사과가 될 수 있지만 한쪽은 모면이고 회피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든 마지막까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서지 못한 채 행간의 해석까지 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씁쓸함과 함께 돈봉투로 상징됐던 과거 여의도 정치가 막이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