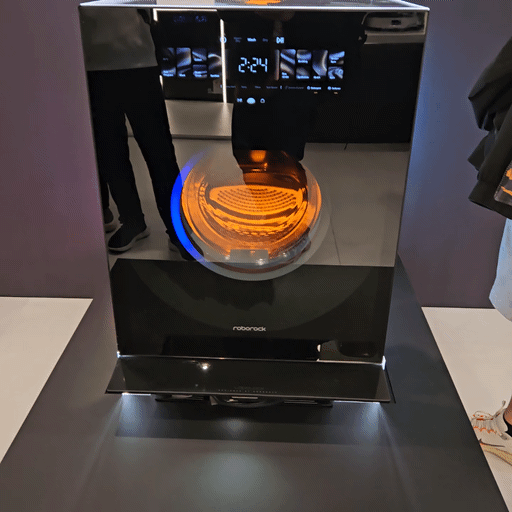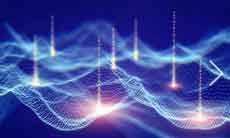1996년 이후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는 25년 산고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나 우려도 적지 않다. 공수처가 공직자 부패를 척결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수처장 1인에게 수사·인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 ‘독주 체제’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각 수사 기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반해 견제 장치는 마땅치 않아 사정 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이날 3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수처가 역사적 첫발을 내딛으면서 기대가 우려가 교차한다. 설립 취지만 보면, 사정 기관 사이 권력 균형은 물론 이른바 ‘윗선’ 비리를 척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만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대목으로 꼽힌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만 언급돼 있을 뿐 다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 반대로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특정 사정 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기준을 공수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인지 사건은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수사의 주체를 결정하는 권한이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이다. 출범하기도 전에 앞으로 수사를 두고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다르다”며 “(공수처장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조라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각 수사기관 사건을 자유자재로 선택·수사하는 등 폭주하는 비이성적 모습을 보이면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수처 인사 등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당연히 공수처장 몫이다.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인사위원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된(또는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채워진다. 반면 야당 몫은 나머지 2명에 불과하다. 인사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여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