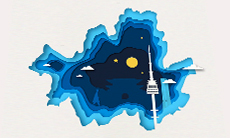씨티은행의 한국 철수설이 또 불거졌다. 그동안의 것이 비교적 뚜렷한 실체 없이 씨티의 대규모 점포 축소 등에 의한 추론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씨티그룹이 한국·태국·필리핀·호주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의 영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으며 철수가 확정돼도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만약 철수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 부문을 그 나라 은행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 이후 뉴욕 증시에서 씨티그룹 주가는 3.6% 오른 65.78달러에 장을 마쳤다. 상승률은 6주 만에 최대치다.
관련기사
씨티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와 관계가 깊다. 최근 씨티그룹 사상 첫 여성 CEO가 된 프레이저는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 세계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씨티의 어떤 사업 부문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레이저 CEO는 2015년 중남미 책임자로 근무할 때도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의 소매금융·신용카드 부문을 매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법인은 1914년에 문을 연 씨티그룹의 첫 해외 조직이지만 프레이저 CEO는 그룹 차원에서 이들 3개국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렵다며 매각을 밀어붙였다.
씨티은행의 한국 철수설은 2014년부터 대략 3년 주기로 제기돼왔다. 2014년 6월 대규모 점포 통폐합과 희망퇴직을 단행하자 철수설이 확산했고 당시 새롭게 취임한 박진회 행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017년 133개 점포 중 101개를 없애겠다고 하자 역시 한국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사는 철저히 수익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씨티은행 철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씨티은행의 주력은 자산관리(WM), 기업금융인데, 매각이 현실화하면 국내 금융지주·지방은행·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당기순이익은 2018년 3,074억 원으로 전년보다 26.1% 급증했지만 2019년 2,794억 원으로 9.1% 감소했고 지난해는 3분기까지 1,611억 원으로 38% 급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많은 글로벌 금융사가 한국을 떠난 데 이어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일조하는 등 ‘금융의 주한미군’ 역할을 하는 씨티까지 떠난다면 정부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