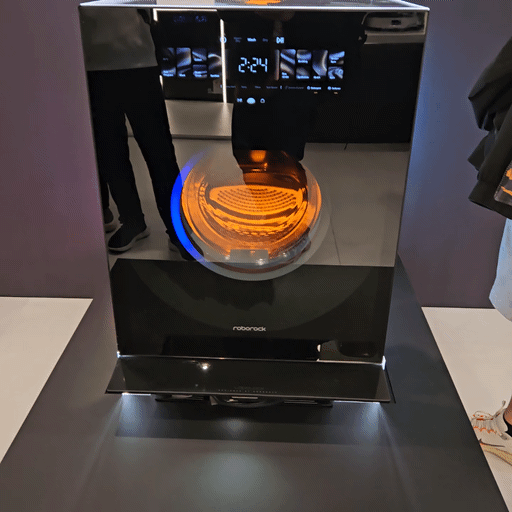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누가 바람을 보았나요...잎새들이 떨릴 때 바람은 지나가고 있어요.’ 영국의 여류 시인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바람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했다.
요즘 언론들은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 예찬에 나섰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들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서야 바람을 감지하고 뒷북치고 있지만 바람의 근원과 본질, 결과에 대해선 제대로 천착하지 못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준석 바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일 뿐이다. 이번 봄바람의 본질은 ‘못 살겠다. 묻지마 바꿔 보자’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대란과 일자리 쇼크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변화’ 열망을 표출하는 것이다. ‘무조건 바꾸자’를 외치다 보니 반사이익이 제1 야당으로 향하는 것이다. 언론 노출이 많았거나 말솜씨가 좋은 인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젊은 바람’의 주역들인 이 후보와 김웅·김은혜 의원이 모두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 ‘오렌지 바람’이라고도 한다.
좁게는 ‘꼰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바꾸자는 바람이다. 결국 기성 정치권 전체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므로 여야 정당은 모두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릎 꿇고 성찰해야 한다. 의원 100여 명 중에 실력을 갖춘 리더가 오죽 없었으면 금배지 선거에서 세 차례나 낙선한 ‘0선’의 이 후보가 금메달을 노리는 상황이 됐을까.
이 후보도 ‘큰 정치인’으로 도약하려면 검증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갈등을 관리하는 국정 운영과 정치는 인기몰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지적된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국정 현안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성장 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다만 ‘안티 페미’를 외치면서 여성 공천 할당제 폐지 등의 퇴행적 주장을 했을 뿐이다. 바로 이 점이 39세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경제 장관을 지낸 마크롱은 풀뿌리 운동 과정에서 사회 개혁 방안들을 마련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노동·연금 개혁 등을 밀어붙였다.
둘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예리하지 않지만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총질할 때는 온갖 수사를 총동원한다. 방송 등에 자주 출연하는 그는 현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을 해왔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 11년’ 기재가 논란이 됐을 때 “정부는 LH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고 점잖게 꼬집었다. 그러나 그는 27일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4선 경력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5+4가 0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마법을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현란한 표현으로 깎아내렸다. 소속 정당을 겨냥해 “해체”를 외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 김세연 전 의원과 닮은 꼴이다.
셋째, 이 후보의 리더십은 ‘야권 통합’ 목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인 유승민 전 의원을 따라 여러 정당을 철새처럼 옮겨 다녔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수차례 말 폭탄을 던졌다. 이 후보는 최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앞에 타면 육우, 뒤에 타면 수입산 소고기가 된다”고 냉소적으로 비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가까운 권은희 의원이 이 후보에 대해 “외관은 청년이지만 기득권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넷째,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 사회 규범을 어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지난 3월 한 음식점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다가 적발됐다.
바람은 짧든 길든 결국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번 경선에서 ‘이준석 잎새’를 흐드는 ‘오렌지 바람’이 태풍으로 커질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 궁금해진다.
/김광덕 논설실장 k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kim@sedaily.com
kdkim@sedaily.com